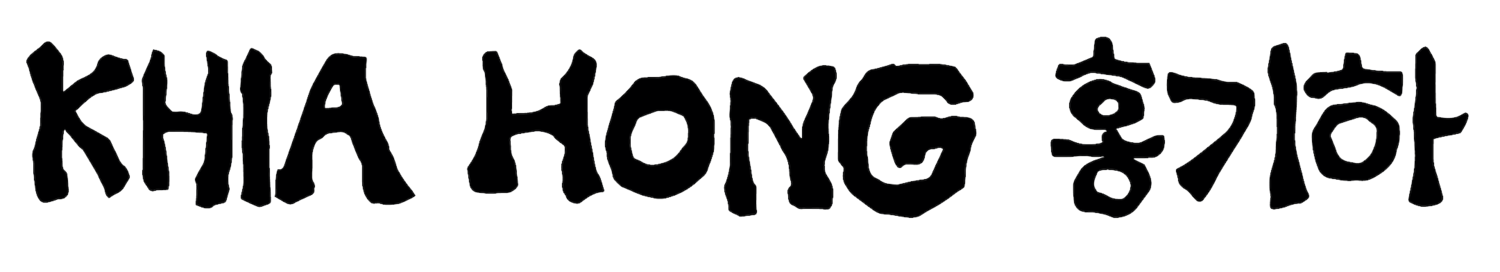Oct. 2021/ 매스와의 격투, 조각의 가능성 Fighting Mass, The Potential of Sculpture / 홍기하 Khia Hong
매스와의 격투, 조각의 가능성 / 아트인컬처 2021년 10월호
작가노트, 작업설명, 전시기획서 등을 작성하다 보면 ‘조각의 가능성’이란 묵직한 말을 여기저기 촐싹대며 쓰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조각에서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로는 엄포를 놓지만, 정작 손과 머리로는 그래본 적이 있던가? 돌이켜보면, 오히려 조각에 절망을 느꼈던 순간이 더 많이 떠올라 잠시 마음이 착잡해진다. 전시를 앞두고 완성된 작품을 넘어뜨려 산산조각 난 작품과 마음을 다시 봉합했던 시간, 한파 속에서 유해 물질을 쓰며 깎여 나가는 수명을 실시간으로 체감했던 기억, 2톤짜리 돌을 지게차로 들어올리다 끈이 끊어져 심장이 멎을 뻔한 순간.... 이런들 무슨 가능성이냐고 쏘아붙인다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까.
몇 달 전 나는 전시 기간 한 달 동안 전시장 앞 야외 공간에서 돌을 깎겠다는 다소 호기로운 계획을 세웠다. 결과물이 아니라 조각을 만드는 과정을 관객이 볼 수 있다면 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확연히 달라지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 시간이 며칠이 넘어 몇 주가 되고, 오는 사람들마저 전동 그라인더의 찢어지는 굉음과 사방에 흩날리는 돌먼지를 피해 멀찌감치 잠시 훑어보고만 가니 잡념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한참을 멍하니 있자니 근처의 노동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돌을 깎고 있던 곳의 바로 10m 건너편에서는 주차장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처음엔 휑하던 흙바닥이 며칠 만에 깔끔한 차도와 인도가 되었던 것이다. 순간 죄책감이 몰려왔다. 나는 ‘진짜’ 노동 앞에서 가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술을 한답시고 돌을 쪼고 있는 나의 행위가 무의미하다는, 그리고 저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생각에 작업이 쉽사리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한번은 미술계 분들에게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공감되지 않을까 싶어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분들은 미술계에 족히 삼십 년은 계셨던지라 나의 이야기를 귀엽다는 듯이, 아니면 다소 한심하다는 듯이 듣는 표정이었다. 그러고는 한 분이 말씀하셨다. “저기요. 차도에는 120km로 달리는 차도 있는 반면 60km로 달리는 차도 있어요. 느린 차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는 차들이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술가는 사회의 그런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번에 이해되는 비유였다. 그리고 내가 본 수많은 브레이크, 즉 조각가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최근 들어 조각가들의 작업 환경에 관심이 생겨 여러 작업실을 방문하고 있는데, 몇몇 곳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같이 열악하고 참혹했다. 흙 한 덩이 옮기기 전에 열 번 더 고민해야 하는 위협적인 계단, 곰팡이와 승산 없는 사투를 벌이는 연약한 환풍기, 얄팍한 비닐로 좁아터진 공간을 쪼개는 파티션,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한 조각에 긁힌 통곡의 벽, 쌓이고 쌓인 조각에 수장고로 변모한 테이블.... 기가 막힐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을 보면 즐겁게 놀러온 마음은 금세 숙연해지고 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 조각의 크기를 줄인다면, 재료를 바꾼다면, 작업을 다 갖다 버린다면, 아니, 그냥 조각을 하지 않는다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 아닌가?
그렇지만 다시 그들의 표정, 그리고 함께 나눈 대화를 떠올려보면 결코 어둡거나 암울하지만은 않았다. 에어 컴프레서를 사용할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해 울분 섞인 열변을 토하지만, 또 그것을 어떤 신박한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찾아 나선다. 새로 주문한 몇 백 키로의 재료를 옮기고 넘긴 무용담을 들으며 연민과 존경심을 느낀다. 조각들 뒤에 숨겨진 시행착오와 사연, 그리고 그것을 만든 이의 반짝이는 눈빛에서 조각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조각의 정의와 고유한 영역이 애매해진 지 오래된 지금, 우리는 다시 ‘조각’이 무엇인지 찾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정해진 답이 없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은 꽤나 외롭고 수고로울 수밖에 없다. 사회가 최고의 효율과 경제성으로 향하는 매끈한 길을 따라 달려갈 때, 조각가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천천히 파내고 있다. 다시 공사장 옆에서 돌을 깎던 때로 돌아가자면, 오랜 고심 아래 조금씩 덩어리를 잘라내던 내 모습을 보고 공사장 노동자들은 그걸 어느 세월에 깎냐는 핀잔과 함께 돌을 더 효율적으로 잘라낼 수 있는 방법과 공구를 추천하곤 했다. 물론 그 방법대로 한다면 내 조각은 훨씬 더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을 나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것이 조각인 게 아닌가.
며칠 전 새로운 작업에 들어갈 돌을 찾으러 갔다. 지난번에 돌을 깎으며 느낀 체력적 한계와 돌에 깔려 죽는 상상에 시달린 이후로는 다시는 내 키보다 큰 돌을 깎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또 여러 돌을 둘러보니 매스의 육중함에 이끌려 웬만해선 만족스럽지 않았다. 쌓여있는 통석 사이에서 눈에 들어온 돌에 대해 문의하니 몸값은 200만원, 무게는 2톤이다. 예정된 예산과 무게는 이미 초과했고 역시 이것을 어디에 보관할지, 어디에 전시할지는 미지수지만, 걱정은 일단 제쳐둘 만큼 돌의 강한 기운에 못 이겨 일단 업어가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동료들의 눈빛을 기억하며 어떻게든 해낼 방법이 있으리란 확신으로 다시 조각의 가능성을 찾아 나선다.
홍기하 / 1994년생. 홍익대 조소과 졸업. 프로젝트 스페이스 영등포(2021)에서 개인전 개최/ <Corners 4: We Move We>(킵인터치 2020), <박하사탕>(별관 2019) 등 단체전 참여. 홍기하는 동시대 조각의 정의와 범주에 질문을 던진다. 거대한 돌과 석고를 깎으며 물성과 매스가 밋밋해진 조각의 경향을 정면 돌파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