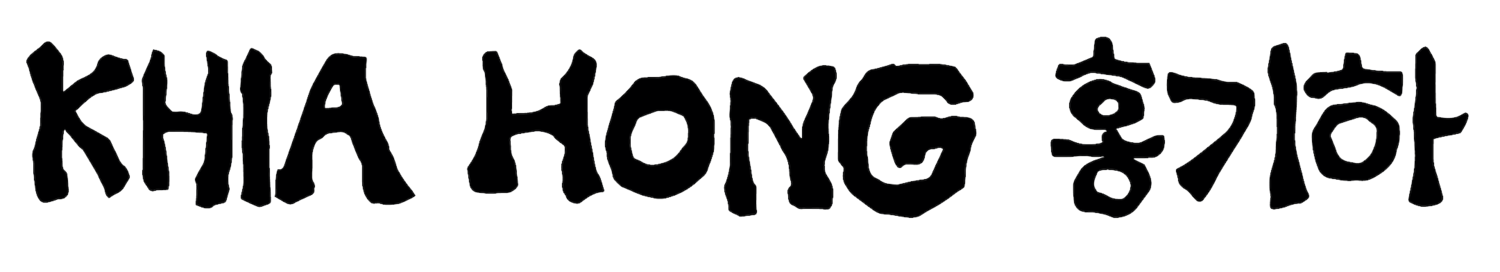July 2022/ 홍기하의 조각, 그 자체의 본성 / 이설희
홍기하의 조각, 그 자체의 본성
이설희(독립 큐레이터)
홍기하(b.1994)는 조각가로, 조각을 바라보는 동시대의 변화를 살핀다. 조각 매체 자체를 재료, 표현, 형상, 조형미 등을 통해 파고드는 작가에게 ‘모더니즘’적인 태도가 읽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잘 알려진 대로, 클레멘트 그린버그(Clement Greenberg, 1909-1994)는 모더니즘 예술이란 즉각적으로 인지 가능한 각 장르의 특성에 스스로를 한정해 그 존재의 의의를 증명하고자 한 예술임을 천명했다. 그에게 이러한 예술의 즉물성(literality)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 매체의 특성을 파고드는 것이다. 물론 그린버그는 매체에서 완벽한 순수성이란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이지만, 그럼에도 각 매체가 그것의 영역 안에서 자신만의 고유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차원 공간에 물질로 구현된 볼륨의 구성체’인 조각은 태생적으로 현실로부터 분리가 불가능한 매체이므로, 고유한 영역의 세계에서 모더니즘의 주체가 될 수 없었다. 형식주의 모더니즘을 역설한 그린버그 또한 조각을 보다 ‘모던’하게 만들기 위한 해법을 제시했다. 바로 신체를 떠난 눈, 즉 실제 공간과 시간에서 벗어난 데카르트적 눈을 통해 본 ‘회화화’된 조각의 외양이다. 조각은 ‘시각적 일루전(optical illusion)’을 바탕으로 관람자가 불투명한 공간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매체, 즉 실제 공간과 시간적 맥락을 외면해야만 했다.[1] 이는 조각의 투명성(transparency)과의 대면으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는 작품에 내재된 ‘개념적 핵심(conceptual core)’과 그것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형태의 일관성이다. 따라서, 모더니즘의 형식주의 관점에서 형태 간의 관계는 순수 형식에 시각을 집중한 산물인 것이다.
홍기하의 조각은 외형상 모더니즘의 형식미를 지니며, 작가는 태도적으로 조각가만의 “고유성”[2]을 인정한다. 그가 던지는 “이 시대의 조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자연스럽게 작업의 화두가 된다. 그렇다면, 작가는 이러한 실천을 통해 조각의 매체적 특성을 간파하고자 하는 것인가? 조각의 개념적 핵심을 찾는 것인가? 시각적 혹은 관념적으로 조각 내부로 침투 가능한 현상을 기대하는 것인가? 혹은 작가에서 작품, 그리고 관람자로 연결되는 끈을 유지하려는 것인가? 작품 자체의 특징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질문들이 모더니즘 비평을 맴돌았던 것처럼 홍기하의 실천에서도 매체 특정적 개념이 읽히는 유사 현상이 관찰되는데, 이는 매체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개념/철학적 사유의 매개가 된 것을 의미한다.
물질로서의 조각
홍기하의 작품에서 재료의 물성은 작품을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이다. 그는 주로 돌, 석고를 다루며, 재료의 특질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업하는데, 재료를 하나의 모듈로 가공하여 다루기보다 재료의 물질적 특성 자체에 관심이 있다. 2019년 첫 그룹전 《박하사탕》(별관, 2019. 2. 7. - 2. 21.)에서 “돌보다 강력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 같다”는 작가의 언급은 조각을 ‘물질’ 자체로 읽으며, 이 재료의 물성에서 조각의 영원성을 견지하는 작가의 관점을 간접적으로 엿보게 한다. 작품이 물질적인 특징으로부터 고유한 성질을 유지하며 물리적 실체로 정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대목인 것이다.
특히, 홍기하의 돌조각에서 재료의 밀도나 중량감 등의 물리적 특성은 작품 구성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일례로, 사암을 깎아 목재 팰릿 위에 올렸던 조각 <Vanilla>(2020), 경주/포천 화강암 및 살구빛 대리석으로 제작한 <Solo>(2021) 시리즈는 최소 높이가 170 센티미터로, 성인 평균 키에 웃도는 물질로서 제시된 조각이었다. 홍기하가 작업에서 돌을 사용한 기록은 2018년부터 발견되는데, 당시 작가는 흑요석으로 <Emily>(2018), <The Thinker>(2018)를, 대리석으로는 <Armature>(2019), <Tex>(2019)를, 화강암으로는 <Notus>(2018), <Head>(2019), <RIP Ya’ll>(2019)과 같은 작품을 만들었다. 이러한 작품에서 재료는 작가의 계획대로 정제/가공되어 제시되었고, 물질의 특성과는 별개로 구성되는 듯했다. 다시 말해, 실질적으로 읽히는 형상은 물질로서의 재료보다 작가의 의도대로 완결된 작품 그 자체가 더 부각된 모습이었다.
2020년부터 홍기하의 돌조각에서는 가공된 장식적 요소를 찾아볼 수 없으며, 재료의 물성이 즉물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재료의 질감을 그대로 노출하고, 재료 자체의 힘을 통해 작품이 구축되도록 한다. 돌의 생산 지역, 종류에 따라 밀도, 볼륨, 성질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홍기하의 조각은 재료의 특성에 의해 구성이 결정되는 조각이라 할 수 있는데, 육중한 무게를 지닌 재료의 특성은 중력의 작용 속에서 만들어지는 힘의 균형을 가시화한다. 한편 작가는 작년부터 석고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 이유에 대해 홍기하는 환경/물리/심리적으로 돌조각을 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실내에서 작업 가능한 석고로 섬세한 감각을 찾으려 연구하고 있다고 했다.[3] 재료와 관계를 맺으며 물성을 탐구하고, 이러한 조형 연습을 기저로 형식미까지 확장해 나가는 데 석고만큼 적합한 재료는 없다는 것이다. 물질에 신체성이 담길 때 조각이 된다는 작가의 신념은, 물질 그 자체의 본성을 강조하며 ‘재료에 충실하기(truth to material)’를 통해 조각의 생명력을 찾아가는 데 있는 것이다.
형상으로서의 조각
홍기하는 조각가로서의 기본 실천인 깎고(彫) 덧붙이는(塑) 방식으로 조각을 만든다. 물론 제작 방식은 재료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작가는 “재료, 매스와 사투한 흔적이 느껴지는 아주 맛깔나는 조형성을 가진 조각을 마주했을 때만큼 인간의 생동감을 느낄 수 있는 때가 있는가”[4]라는 작가 스스로의 물음으로부터 조각만이 보여줄 수 있는 조형미를 상상하며 깨달음의 순간을 갈구한다. 2020년부터 홍기하의 조각 전반을 관통하는 형식적 특성으로 볼륨의 탈각, 양감의 결여, 교차와 관통, 표면 처리의 대비, 면과 곡선, 구조와 덩어리, 불안과 균형감, 그리고 추상 형태의 변형을 꼽을 것이다.
이처럼 조각에 있어서 형태의 미학적 실험을 지속하는 홍기하에게 예술은 문자 그대로의 추상, 즉 순수한 정신의 울림 그 자체를 드러내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조각의 전형적인 조형미를 찾는 그의 작업 결과물에서 형태를 덜어내는 실천이 목도된다. 즉 형식을 소거하는 미학이 발견되는 데, ‘정신성’을 구현하고자 형태를 감축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형태가 형태 외적인 주제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독자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홍기하에게는 형태를 규정짓는 ‘유기적/기하학적’의 이분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조각은 외계의 형태를 은유할 필요 없이 더욱 추상화될 가능성을 지니는 매체가 된다. 이러한 형태는 알 수 없는 힘으로부터 형태 그 자체로 나타난다.
이는 오직 조각가 홍기하 개인의 감수성, 직관에 의해 가능한 실천이다. 조각만이 보여줄 수 있는 조형미, 그것은 매스와 중력과의 사투일 뿐만 아니라 완성 시점을 결정짓는 예술가의 주체적 선택, 작품의 개념적 핵심, 관람자의 시각적 일루전 등을 포괄하는 총체적 경험의 소산이다. 아울러 이는, ‘추상-창조(Abstraction-Creation)’의 등식으로 나아가며 작업의 외연을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기제가 된다. 작가가 언급하는 조각이란 “자본주의 사회 하에 가장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기 때문에 가장 큰 가치를 지니는 것”[5]이라는 결론에서 역설의 미학을 본다. 애초에 조각적 현현(顯現)이란 도달할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지속 가능한 역설을, 예술이 여전히 자체의 영역 내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본다. 20세기 모더니스트들이 그러했듯 조형미 연구가 가능한 공동체의 환생을 작가 홍기하는 꿈꾸고 있다.
[1] Clement Greenberg, “Sculpture in Our Time,” Arts Magazine (June 1958), reprinted in Clement Greenberg: The Collected Essays and Criticism. Volume 4: Modernism with a Vengeance 1957–1969, ed. John O’Bria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58.
[2] 홍기하는 인간만이 창조할 수 있는 최고의 정점에 조각가가 있다고 언급했다. 작가와의 인터뷰, 2022년 6월 5일, 춘천 예술소통공간 곳
[3] 윤정의, 홍기하 2인전 《조소의 즐거움》(청년예술청 화이트룸, 2022. 4. 26. - 4. 30.) 브로슈어. 조각가 윤정의와의 문답으로 구성된 글이다.
[4] 홍기하 개인전 《VANILLA II》(레인보우큐브, 2022. 7. 15. - 7. 31.) 텍스트. 작가가 자문자답하는 형식의 글로, 질문은 총 12개 – 이 시대의 조각이란 무엇인가? 왜 더 이상 크고 무거운 조각은 탄생하지 않는가? 우레탄폼은 조각인가? 스티로폼 이후에는 어떤 것이 조각의 주재료가 될 것인가? ‘조각가’는 누구를 지칭하며, 본인을 조각가라고 생각하는가? 모더니즘 시기보다 조각에 대해 더 진지할 수 있는 시대가 있는가? 건강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멋진 조각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가? 노동이 개입된 조각은 그렇지 않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가? 조각이 ‘귀엽다’는 것은 칭찬인가 비하인가? 조각의 채색은 회화의 것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여성적’ 조각이란 무엇인가? 지금은 조각의 암흑기인가? – 로 구성된다.
[5] 홍기하 개인전 《VANILLA I》(프로젝트 스페이스 영등포, 2021. 1. 20. - 2. 7.) 전시 서문.
Apr. 2022/ 조소의 즐거움에 대하여 / 홍기하 윤정의
조소의 즐거움에 대하여
윤정의, 홍기하
2022년 4월 2일, 11일
윤정의: 전시를 만들게 된 계기부터 말해보자. 먼저 내가 ‹조소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을 제시했는데, 이번 겨울에 두 달 정도 조그만 인체 조각을 만들기 위해 흙으로 조소를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너도 조소가 재밌지 않을까 싶었고, 이런 즐거움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깎고 붙이는 과정을 통해 조각을 만든다는 방법을 중심으로 두고 우리의 결과물을 제시하는 자리인데 이런 취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
홍기하: 네가 ‹조소의 즐거움›이라는 전시 제목을 던져줬을 때 그거 자체로 우리 둘의 전시가 상상이 갔어. 굳이 그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기획을 덧붙일 필요 없이 그냥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거를 보여주면 되겠구나 싶었어.
정의: 그러면 전시 얘기를 듣고 나서 전시를 위해 작업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는 거지?
기하: 응. 원래 하던 것이지만 부담 없이 좀 더 러프하게, 내 기준에서 완성이라고 생각이 안 들지라도 전시해보자는 생각이 들었어.
정의: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작업을 할 때 느끼는 ‘즐거움’의 면모들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했고, 너도 분명히 그걸 느끼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너와 이 전시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어.
기하: 나는 여태 전시를 기획할 때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맡아서 했는데, 이번엔 너한테 많이 맡길 수 있어서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
정의: 나는 네가 전시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을 때 뭔가를 좀 생각하고 있나 싶었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래서...
기하: 그렇지만 마음이 통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별로 걱정이 안 돼. 처음부터 끝까지 즐거운 마음으로만 하려고.
정의: 그러면 이번 전시에 낼 작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해줘.
기하: 작년에는 내가 광기에 휩싸여서 커다란 돌조각을 하겠다고 나댔는데, 이제 와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내가 너무 내 분수와 맞지 않게 무리를 했나 싶었어. 그리고 돌은 야외에서 물과 땀을 사방에 튀기면서 와일드하게 작업해야 하는데, 그에 비해 석고는 실내에서 조용하게 작업하기 때문에 그런 고요한 시간이 그리웠어. 그래서 올해는 석고에만 집중하면서 작업실에 앉아서 좀 더 섬세하고 우아한 나만의 감각을 찾으려고 연구하고 있어.
정의: 정말 공감하는 게, 나도 작년에 작업실에서 하루 종일 조각을 만들고 그걸 옥상에 들고 올라가서 깎고, 다시 그걸 들고 내려오는 걸 반복하면서 몸이 너무 힘들었어. 그런데 그 후 몇 달간 앉아서 조그만 조각을 만드니까 신체적으로 지쳤던 게 사라지고 만들기가 재밌어진 것 같아. 만들기를 거리를 두고 보게 되기도 했고. 너도 같은 생각을 했구나.
기하: 맞아. 그리고 그런 작업의 물성과 환경에 따른 마음 상태가 내가 작업할 때 듣는 음악에서도 투영이 되는 것 같은 게, 돌을 깎을 때는 무조건 엄청 시끄럽고 샤우팅하는 펑크 음악을 많이 들었단 말이야. 공구 소리가 시끄럽기도 하고 육체적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정의: 그렇지. 나도 옥상에서 깎을 때 그라인더 소리에 귀가 찢어질 것 같아서 음량을 최대로 키워놓고 시끄러운 노래를 들었어.
기하: 요새 석고 작업하면서는 클래식도 많이 듣고 존 레논[1] 인터뷰 같은 것도 무한 반복으로 틀어놓고 들어. 내가 정말 세상에 있는 존 레논의 인터뷰를 다 찾아서 들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 그래서 작업도 전보다는 조금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이 들어.
정의: 계절에 따라서 네 상태가 달라질 때는 없어? 나는 이상하게 겨울에는 몸이나 근육을 만들고 싶은데 여름에는 인체를 만들고 싶은 욕구가 줄어드는 것 같아.
기하: 왜?
정의: 글쎄, 이번 겨울이 되자마자 갑자기 몸을 엄청 만들고 싶더라고. 너는 작년에 큰 작업들은 여름쯤에 했는데 겨울이 되어서는 안으로 들어갔잖아.
기하: 그건 날이 따뜻할 때만 야외 작업이 가능하니까 그렇지. 근데 나는 겨울에 작업이 잘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날씨 좋을 때는 작업실에 별로 안 있고 싶고 돌아다니고 싶은데, 겨울에는 내가 추운 걸 싫어해서 밖에 잘 안 다니고 작업실에만 처박혀 있어. 그래서 작업이 잘되는 것 같아. 그리고 작업실이 춘천이라서 서울보다 더 춥고 눈이 와도 진짜 많이 오는데 그런 요소 때문에 뭔가 내가 강원도의 ‘고독한 예술가’가 된 기분에 더 그 이미지에 몰입하게 되는 것 같아. 권진규[2]가 된 기분이랄까? 권진규도 춘천에 살았잖아.
⁂
기하: 이 전시가 창작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보여주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원래는 각자 자신의 작업에 대해 글을 쓸까 하다가 서로의 작업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기로 했어. 너부터 얘기해봐.
정의: 먼저 네가 석고라는 재료에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순간이 궁금해.
기하: 나는 항상 석고가 기초를 다지는데 좋은 재료라고 생각했어. 우리가 미술학원을 처음 가도 석고로 만들어진 입방체, 원형 뿔, 아니면 줄리앙 석고상 같은 걸 보면서 기본을 배우잖아. 그래서 석고를 보면 ‘미술 조형의 기초’라는 이미지도 있고, 또 나는 캐스팅하는 걸 엄청 싫어하는데 석고는 직조[3]를 하면 캐스팅도 안 해도 되고, 내가 깎을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다는 자유로움이 좋았어.
정의: 맞아. 캐스팅은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없다는 게 아쉽지. 캐스팅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형태를 더 발전시키거나 할 수 없잖아. 캐스팅을 다 하고 나면 그 과정에서 떠올랐던 순간의 계획도 사라지고. 좀 더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면 당연히 직조가 떠오르는 것 같아.
기하: 그리고 일반적인 캐스팅 과정에서는 내가 조각의 완성본의 형태를 생각하면서 거기를 계속 향해가며 수정하는 느낌인데, 그러면서 원형에서 표현했던 것을 잃게 되는 것도 많고, 캐스팅 가다[4]를 어디서 나눠야 될지 미리 계산을 해야 하고. 기껏 다 만들었는데 선배가 지나가면서 “야 이거는 절대 캐스팅 못 해”라고 하거나 “너 50가다 라고 들어봤어?”라고 하면 엄청 스트레스인 거지. 석고 직조는 그런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서 좋아. 깨지면 바로 쉽게 보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난 내 작업이 막 몇십 년 지났을 때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 석고 색이 변하는 것도 엄청 멋스러운 것 같아. 작업할 때 만지는 석고 가루의 순백색의 아름다움도 있지.
정의: 나는 기억에 남는 게 예전에 주형 기법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이 석고를 섞는 방법을 가르쳐주면서 “여기 문교 석고에 쓰여 있는 혼수비가 있는데 그 혼수비대로 하면 석고가 굉장히 되직해지니까 그대로 하지 말고 물을 더 부어라”라고 알려주시는 거야. 그런데 왜 혼수비대로 하면 안 될까 하는 생각에 그대로 해봤더니 직조를 하기 적당한 상태가 나오는 거야. 또 그 전에는 에폭시 퍼티에다가 아크릴 물감을 섞어서 조색을 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당연히 석고도 조색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기하: 나는 예전에 마산에서 하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했었는데 생전 처음 가보는 곳이어서 너무 할 게 없었어. 그런데 거기 옆에 문신미술관이 있길래 가봤는데 문신[5]이라는 사람이 석고 직조로 너무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야. 석고 직조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표현을 다 해놨길래 석고가 이런 가능성까지 있는지를 알게 되었고, 그걸 문신이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어. 그래서 혼자 여러 가지를 시도해봤는데 석고는 완전 폴리싱된 대리석처럼 매끈하게도 만들어볼 수 있고, 또 반대로 완전 거친 질감도 연출할 수 있는 너무 좋은 재료인 거야. 그리고 내가 건강도 안 좋았어서 건강한 재료를 생각하다 보니깐...
정의: 석고는 절대 건강한 재료라고 할 수 없지. 건강에 좋은 재료는 아니야.
기하: 그래도 조소과의 야만의 시대에 쓰던 폴리[6] 같은 화학 재료나 스티로폼 자르는 데 나오는 가스보다는 낫잖아. 그런 재료는 절대 안 쓰려고 했지.
정의: 자코메티[7]도 석고로 직조를 했고, 석고 직조를 했던 과거 조각가들은 많은데 어느 순간부터 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없게 되었을까?
기하: 그게 외국에서는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석고 직조를 옛날 조각가들은 거의 다 꼭 배웠다고 들었어. 그런데 그걸로 작업까지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문신이랑 최의순[8]밖에 없는 것 같아. 폴리가 등장하면서 석고를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석고를 많이들 잊게 된 건가?
정의: 예전에는 석고가 깎기가 되게 힘들다고 생각했었는데, 초경석고[9]를 써보고 나니까 A급 석고는 말랑말랑하다는 생각이 들어. 칼만 그냥 잘 쓰면 슥슥 깎이니까 직조하기 좋은 재료인 것 같아.
기하: 나도 여러 종류의 석고를 써봤는데 제조사마다 다 석고의 성질, 경화 속도, 경도, 색이 다른 게 신기했어.
정의: 그러면 돌이나 석고 외에 흥미를 느끼는 다른 재료가 있어?
기하: 흙. 흙도 항상 뭔가를 캐스팅하기 위한 재료로만 쓰이잖아. 그런데 그냥 흙 자체를 말려서 전시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 석고 직조와 같은 맥락에서.
정의: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기하: 흙은 정말 모델링 하기에 좋은 재료잖아. 그런데 컨트롤하기 쉬울수록 오히려 더 어려운 재료란 말이야. 물성에 제약이 많을수록 더 다루기에 거침없을 수 있다고 해야 하나? 자유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난 더 어려워서 흙은 나중에 석고를 내가 어느 정도 좀 안다고 생각했을 때 넘어가고 싶어.
정의: 그렇지. 흙으로 하면 뻔한 표현이나 질감이 나오는 게 쉬우니까 나도 작업을 하면서 그걸 많이 고민하게 돼. 이것에서 어떻게 재밌는 표현과 질감을 찾을 수 있을지.
기하: 흙으로는 사실 거의 다 표현이 가능하잖아. 그런데 특히 돌은 그게 더 안 되니까 어느 정도에서 타협 가능한 게 있단 말이야. 그런데 흙은 그게 아니잖아? 얼마든지 네가 하면 다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더 들키기도 쉬워. 그런데 난 돌은 이제 별로 궁금한 게 없어. 작년에 내가 키가 2미터 넘는 큰 것도 해보고 싶어서 다 해봤더니 더 이상 궁금증이 없어졌어.
정의: 그러면 돌에는 흥미가 떨어진 거야?
기하: 흥미가 떨어졌다기보다 아직 내가 이걸 좀 더 소화할 기간이 필요해. 아직 이런 걸 할 깜냥이 안 됐는데 너무 까불었어. 그래서 돌은 나중으로 보류하고 이제는 석고를 좀 더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들었지.
정의: 흙을 사용해보니까 이것도 수분량에 따라 나오는 표현도 달라서 수분량도 조절해야 하고, 그에 따라서 중력을 견디는 역학도 다르고, 미세하게 조정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 또 직조를 하고 싶다면 석고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퍼티나 테라코타[10]도 있잖아. 예전에 직조를 해보려고 점토 조각 수업을 들었는데, 큰 덩어리를 구우려면 내부가 비워져서 흙의 두께가 1cm가 되어야 한대. 그 1cm를 맞추려고 노력해서 간신히 두상을 하나 만들었어. 그런데 1250도로 재벌을 구우니까 얼굴 한쪽이 푹 꺼져서 뒤틀려 나와서 충격을 받았어. 그때 흙을 가마에 굽는 것도 제한이 많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내가 직조할 수 있는 재료 중 석고가 제일 낫다는 결론이 났던 것 같아.
⁂
정의: 나는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내가 재료를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는 측면이 불과 2-3년 전의 나와 비교해서 엄청 넓어졌다고 느꼈어. 너는 어때?
기하: 나도 그런 것 같아. 전에는 ‘문신스럽게’ 석고를 사용해보는 것에 집중을 해서 석고를 반듯하고 이쁘게 갈아내는 연습을 했는데, 그거를 하고 나니까 이제 더 다양한 나만의 표현도 해볼 수 있겠다 싶어. 석고가 완전히 굳기 전에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들도 터득했고, 경화 정도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도 파악해가면서 표현할 수 있는 텍스처도 더 넓어졌어. 그리고 요즘에는 석고에다가 색을 더하거나 다른 재료를 섞어서 형태를 만드는 것도 하는 중이야. 그런 연구의 결과가 이번에 전시할 것들이야.
정의: 석고 자체에 색을 섞으면 형태에 반응할 수 있는 방식과 범위가 훨씬 달라지지 않아? 석고의 색을 바꾸기 위해 석고 표면에 칠을 하는 건 몇 번 시도해 봤을 때는 별로라는 생각이 들었어. 너는 색을 섞으면서 형태를 만드는데 뭐가 달라진 것 같아?
기하: 나는 색을 쓰기 시작한 게 색이 없으면 내가 바르고 깎은 것들의 시차가 보이지 않아서 이게 한 덩어리를 깎은 건지 여러 겹을 쌓은 건지 알 수가 없어. 석고를 갤 때마다 색을 섞어서 바르니깐 그 시간들의 레이어가 보여서 재밌었어. 이걸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쓸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작업들은 다 물음표가 달려있어. 그런데 색이 들어감으로써 작업에 ‘MZ스러움’이 생기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경계하고 있긴 해. 괜히 ‘인스타그래머블(Instagrammable)’한 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 것 있잖아.
정의: 그러면 ‘인스타그래머블’한 것에 대해 한마디하고 싶은 게 있어?
기하: 요즘의 조각들이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나는 그 열차에 탑승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런데 너는 왜 이거에 대해 말을 안 덧붙이고 피씨한 척해? 너도 말해봐.
정의: 나는 되고 싶은 것과는 별개로 내 작업이 인스타그래머블하지 않은 게 약간 슬픈 것 같아.
기하: 너의 작업이? 왜?
정의: 왜냐하면 가끔 사진 찍으면 내가 보던 거랑 달라서 흠칫할 때가 있거든.
기하: 그런데 나는 확실히 잘 만든 조각은 사진에서 훨씬 뒤떨어져 보인다고 생각해. 사진은 정말 딱 그 한 면만을 보여주잖아, 조각은 360도로 관람을 해야 하는 건데. 눈 한 개로 감상하는 것과 눈 두 개로 감상하는 것의 엄청난 차이야. 그래서 사진이 별로라는 거는 반대로 조각이 좋다는 말 아닐까? 인스타그래머블한 것들은 반대로 실제로 보면 형편없거든. 예를 들어 인스타를 의식한 빵집들은 보면 딱 사진 찍기 좋은 구도들에서만 채도 높은 벽지에 화려한 데코레이팅과 디스플레이를 뽑아내고 실제로 가보면 빵은 다 푸석푸석하게 말라 있고 먼지 붙어 있고 지저분한 그런 거지. 전시장의 작업도 마찬가지야.
정의: 그러면 조각은 사진에 담기지 않는 뭔가가 더 있어야 한다?
기하: 당연하지. 조각을 만드는 건 우리의 실존을 다루는 것이라고 생각해. 물질 세계를 사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걸 만드는 거잖아.
정의: 그러면 오히려 조각을 만드는 게 너무 쉬우면 그런 느낌이 안 올 것이다?
기하: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조각은 존재 이유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해. 정말 물질 세계를 사랑해서 물질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보다 인스타 세계를 사랑해서 인스타 세계를 향해서 존재하는 것들이잖아.
정의: 나는 조각을 만들면서 사진의 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지 생각해보면 그건 아니지만, 그보다는 조각을 만드는 과정에서 물질과 관계 맺는 방식을 더 주된 변수로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 조각을 보다 보면 작가가 그 형태를 만들면서 뭐에 집중했는지 보이잖아. 어떤 형태를 만들기 위해 재료를 아예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재료가 주는 물성의 형태를 그저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재료에 반응하며 형태를 만드는 것과 물질과 무관하게 형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게 재미있는데, 그냥 엎치락에서 끝이 나면 좀 재미없지.
⁂
기하: 너의 ‹머슬› 작업에서 흙으로 만든 뼈대 위에 석고를 바르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생기게 된 거야?
정의: 처음에는 아이소핑크를 뼈대로 이용해서 그 위에 석고를 붙였는데 거기에서 한계를 많이 느꼈어. 왜냐하면 아이소핑크에 붙인다는 건 결국 내가 아이소핑크의 형태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잖아. 그 형태 위에 석고를 붙이는 와중에 다르게 바꿀 수 있는 가능성도 적어져서 뼈대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했어. 작년 초에 ‹모델› 작업을 제작하면서 그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생각했던 이름은 ‘임시 지지체’야. 흙을 뼈대이자 몰드로 사용하게 되는 건데, 뼈대는 안에 있는 건데 몰드는 밖에 있는 것이니깐 그 둘이 동시에 기능한다는 게 재밌잖아. 흙으로 살짝 만든 다음에 거기에 석고를 올리면 그게 뼈대가 되었다가 석고가 굳으면 흙은 떼어버리면 되는 거고. 그러면 흙은 손으로 쉽게 만들 수 있는 몰드가 되는 거지.
기하: 그러면 흙이랑 석고랑 분리가 깔끔하게 되나? 나는 옛날에 캐스팅할 때 석고 몰드에서 흙 원형을 떼어낼 때 흙이 깔끔하게, 원형이 훼손되지 않고 떨어질 때 기분이 엄청 좋았어서 너의 작업에서도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상상했어.
정의: 그런 걸 생각할 틈은 없는 것 같아. 네가 말한 그 캐스팅 과정에서 흙이 잘 분리되었을 때의 쾌감은 조소과라면 다들 느낄 거야. 그런데 그건 기분은 좋긴 하지만 슬픈 일인 것 같아.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면 고작 그게 잘 분리되는 게 기분이 좋겠어. 나는 그런 감정이 드는 것조차 싫고 그냥 쉽고 빠르게 만들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원했어.
기하: 그러면 만약에 네가 나중에 진짜 큰 조각, 예를 들어 높이 3미터의 조각을 만든다고 해도 그 안에 뼈대를 안 넣을 거야?
정의: 큰 조형물이 어떻게 서 있고 지지가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당시 나에게는 뼈대를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가 중요했지만 지금은 뼈대와 덩어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 내가 흙으로 몰드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뼈대 같은 걸 안 넣는 건 아니고, 부러지지 않기 위해서 철사를 대거든. 그러면 철사가 있으니까 뼈대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할 수 있는데, 먼저 몰드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뼈대를 댄 거잖아. 뼈대를 만들고 형태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형태가 있고 뼈대가 따라가는 것이니까 다른 거라고 생각해.
기하: 나도 조각의 정해진 형태를 생각하고 시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뼈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작업실에 굴러다니는 것들을 뼈대로 사용을 해서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상상하는 형태를 그 위에 붙이고 있어. 그래서 이 조각 안에 있는 뼈대가 뭔지를 힌트를 주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아직 잘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내가 뼈대로 사용한 오브제에서 출발한 형태 중에 뼈대 자체를 많이 벗어난 형태를 표현하고 싶으면 이제 그 형태를 지지하기 위해서 그 뼈대 사이에 스티로폼이나 우레탄폼 같은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을 솔직하게 보여주는 게 맞는지, 이것을 보여주지 않고 다 석고로 덮어버려서 마치 내부까지 석고인 척하는 것이 정직하지 못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모종의 죄책감이 있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했어.
정의: 그러면 지지할 수 있는 다른 사물을 옆에다 넣어서 연결하면 안 되나?
기하: 어떨 때는 내가 확실하게 딱 표현하고 싶은 형태들이 있거든. 그럴 때는 폼이 엄청 효과적이란 말이야.
정의: 그것도 정말 공감이 되는 게, 만약 공중으로 뻗어나가고 싶은 형태가 있어, 그걸 흙으로 만든다고 하면 다 무너질 테고, 차근차근 굳혀가며 쌓아서 만들 수는 있겠지만 정말 비효율적이잖아.
기하: 그렇지만 그걸 고민한다는 자체로 용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걸 우리가 이렇게 고민한다는 것만으로도 문신 선생님이 용서해 줄 거야.
정의: 다른 조각가들도 너처럼 공간으로 날개를 뻗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잖아. 원하는 형태로 공간에 어떤 아무런 제약이 없이 존재하고 싶을 텐데.
기하: 우리 선배가 했던 말 중에 재미있었던 게 ‘조각은 중력과의 싸움’이라고 했어.
정의: 맞아. 중력 또한 결국에는 물성의 일부인 것 같아.
기하: 나는 그런 싸움이 있기 때문에 조각이 더 의미 있는 것 같아. 그 중력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아니면 이 중력의 영향 안에서 내가 어떻게 재미있는 형태를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체가 어떤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아닐까.
정의: 그렇지.
기하: 요즘에 막 VR 쓰고 만드는 가상 조각 있잖아.
정의: 알아. 너무 재밌어 보이던데. 그건 가소롭다는 거야?
기하: 가소로운 게 아니라, 그건 중력의 영향을 안 받아서 뭐든지 만들 수 있겠지만 그러면 재미없잖아. 아무리 기발한 형태를 만들어도 나는 인간이 중력과 싸워서 이겨낸 방법을 만든 걸 보는 게 더 재밌어.
정의: 그러면 VR 조각은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지 못한다?
기하: 아니, 작업의 포커스 자체가 다른 거지.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정의: VR로 그림 그리고 조각하는 영상을 봤는데 너무 해보고 싶었어. 진짜 재밌어 보이더라고. 내가 그걸 했을 때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반응하게 될지도 궁금해. 실제 흙을 만지는 것처럼 반응할지?
기하: 그런데 그거는 만들어도 디지털 환경에서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게 더 슬프지 않아? 그거를 출력하려면 또다시 중력과의 싸움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 나는 내가 아무리 VR로 재밌는 형태를 만들어도 그거를 현실 세계로 다시 가져올 수 없으면 재미없을 것 같아.
⁂
기하: 너의 작업에서 색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물어보고 싶었어. 예를 들어서 그 ‹손›에서는 색을 어떤 기준으로 썼는지, 덩어리 채로 짜여서 올려진 유화 물감 같은 건 어떤 의도인지?
정의: ‹손› 작업을 만들 때를 얘기하자면, 조색한 석고를 쌓아 올려서 형태가 나오는 과정 중에 한 가지 톤으로 붓으로 석고를 얇게 발라.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간이랑 딱 밀착이 된다고 생각해. 그전까지는 그 형태가 공간과 분리가 되어 있는 느낌인데, 그 위에다 다시 한 톤으로 바르면 밀착이 되는 거지. 거기다 또다시 다른 색의 석고를 올리면 어디는 합쳐지고 어디는 분리되는 그런 레이어들이 계속해서 요동치는 걸 상상하면서 색을 사용했어.
기하: 유화 물감 덩어리는 약간 ‘끼’? ‘기갈’?
정의: 기갈도 그렇고, 수동 공격적인 게 아니냐는 말도 들었어. 석고에 색을 섞는 순간 이제 형태와 색을 함께 봐야 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물감이 떠오르잖아. 석고에 안료를 섞은 걸 보완하기 위해 물감을 사용한 것처럼 보이면 수동 공격적으로 보일 수 있고. 어쩌면 그 말이 맞다는 생각도 들어. 동시에 물감도 당연히 색의 덩어리인데 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어. 작업실을 같이 쓰던 친구가 회화 작업을 하는데, 얘기를 하면서 작업도 보고, 물감을 살펴보는데 어느 순간 물감이 갑자기 해상도가 굉장히 높은 색깔의 덩어리로 보이는 거야. 당시에는 안료를 섞어서 어디까지의 채도와 어디까지의 명도를 만들 수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차여서 한 번 써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기하: 맞아. 물감 자체에 해상도가 있었는데 그걸 석고랑 섞어서 좀 뿌옇게 될 때 실망감이 들지. 완전 까맣게도 해보고 싶었는데 석고 가루가 하얘서 그게 잘 안되더라고.
정의: 이런 생각도 들어. 물감은 안료 더하기 바인더잖아. 석고도 물로 경화하는 일종의 바인더니까 안료랑 섞으면 석고도 물감이 되는 거지.
기하: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네가 인체 모델링을 할 때 본질적으로 포착하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그러니까 그 인간 자체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철저히 인체의 형태와 조형에만 주목하는 것인지?
정의: 결국에 ‘사람을 왜 만드냐’는 질문인가? 사람을 만드는 이유는, 첫째는 사람이 만들기가 제일 어려워서. 사람은 왠지 잘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거든. 사람은 가만히 있지도 못하고. 또 형태도 제일 재미있고.
기하: 그러면 모델링하는 대상의 본질이나 그 인간 자체에 포커싱했다기보다는 조형적인 면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볼 수 있겠네.
정의: 나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본질이 뭘까?’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싶은데 슬프게도 그런 생각은 안 들어. 조각을 만들면서는 조각이 대체 뭘까 같은 생각은 하지만. 그런데 예전에 사람 얼굴을 드로잉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변 사람들이 한국인이니까 그리고 있으면 얼굴에 표현할 게 정말 없단 말이야. 막 아주 미세한 명암을 찾아내서 그리다 보면, 이게 이 사람을 표현하는 맞는 방법일까? 혹은 말마따나 본질적인 접근일까? 라는 의문이 드는 거야. 동양인 얼굴은 안와, 코 주변의 깊이 차이도 거의 없고 이마는 완만하잖아. 가끔 보면 광활한 대지 같은 느낌인데, 그러다 딱 서양인의 얼굴과 두상을 보면 명암과 구조로 접근하는 게 자연스러웠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에 비해 아시아인은 차라리 선으로 접근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
기하: 그러면 다음 질문은, 네가 만든 청년 남성들을 보면 어느 정도 성적 대상화 되었다고 느끼는데 너도 그렇게 생각해?
정의: 처음 모델이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어. 예전에는 모델이 거리감이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학부 때 두상을 만드는 수업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두상을 만들기 너무 싫은 거야. 수업이 둘로 나뉘었는데, 한쪽은 모델을 보고 만드는 거고 다른 한쪽은 자유롭게 만드는 거였어. 처음에는 자유롭게 만드는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델이 왔는데 잘생긴 거야. 얄쌍하고 차가운 인상이었는데, 그래서 곧바로 모델을 보고 만드는 쪽으로 붙었지. 그런데 어느 날, 모델이 왔는데 얼굴 온갖 군데에 피멍이 들어서 온 거야. 전날에 누구랑 싸웠나봐.
기하: 정말 귀엽다.
정의: 어. 그 사람이 거기에 그렇게 앉아 있는데 너무 흥분이 된다고 해야 되나? 너무 쾌감이 들더라고. 이 사람이 누구랑 싸울 정도로 성질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의무감에 의해, 혹은 일을 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려고 앉아 있다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 그때의 경험이 나중에 사람을 만들 때 영향을 미친 것 같아. 그리고 또 옛날 조각가들 보면 여자를 엄청 많이 만들었잖아. 사람을 만들면서 그런 조각을 보면 ‘하, 이 사람은 얼마나 여자를 사랑했으면 이렇게 많이 만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기하: 그렇기 때문에 네가 여자를 안 만드는 거구나.
정의: 그렇다고 여자를 ‘안 사랑한다’는 건 아니고... 그보다는 내가 조각에서 주로 보지 못했던 인체를 만드는 것에 대해 자주 생각해.
기하: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섹슈얼한 관심과 텐션이 있어야 확실히 훨씬 재밌어지는 거잖아. 그건 조각뿐만 아니라 그냥 인생의 재미도 그렇지만. 네가 만든 여자는 얼마나 객관적이고 건조하고 재미없을지 궁금하다.
정의: 맞아. 텐션이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예전에 여자 누드 모델을 해본 경험으로는 좀 다르게 접근하게 됐던 기억이 나. 또 무엇보다 건조하고 객관적으로 만들었노라 자부할 수 있어.
기하: 그러면 라이브 모델로는 해볼 생각 없어?
정의: 라이브 모델은 한두 번 시도해 봤는데 시간이 훨씬 많아야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좀 더 막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기하: 그래서 보통 조각가들이 다 자기 애인을 제일 많이 만들었잖아. 그냥 맨날 옆에 있으니깐 강제로 앉혀놓고서 그렇게 굴린 거 아니야. 너도 네 애인을 그렇게 시키면 되잖아?
정의: 내 애인은 그걸 절대 못 할 성격이라.
기하: 못하는 게 아니라, 그건 네가 그만큼 강압적이지 않아서 그래. 앉으라고 시키고 조금 움직이면 버럭 화내고. 다들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정의: 그것도 재미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 막 억지로 가만히 있게 만들고.
기하: 그리고 약간 가스라이팅을 했겠지. ‘너는 나의 모델이 되는 게 영광이다’라는 식으로 멋진 예술가인 척했으니깐 그게 가능하지 않았을까? 너도 그렇게 해봐.
정의: 드로잉은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을 많이 드로잉했는데, 조각은 좀 어려운 것 같아. 드로잉은 모델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반면 조각은 신경 써야 할 게 많으니까.
기하: 그런 데에서 너의 그런 애티튜드가 느껴지는 것 같아. 너는 강압적이지 않아서 그런게 아닐까? 옛날 사람들은 지네 마음대로 모델을 컨트롤했으니까 가능했는데 요즘에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너는 요즘 사람의 조각인가?
정의: 요즘 사람이 모델을 보면서 조각을 만드는 방법에는 뭐가 있을까 생각이 드네.
기하: 그런데 요즘에는 그냥 컴퓨터상의 이미지들만 보면서 그리는 사람들도 많잖아. 네가 완전 그런 MZ 같은 건 아니면서도 또 모델을 비인간적으로 대하는 옛날 사람은 아니니깐 그 사이의 중간 지점에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나는 네가 키링남 하나 데리고 다니면서 하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긴 해. 너의 성격상 또 그렇게는 못 할 것 같지만.
정의: 혹시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 저의 모델이 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제가 기쁘게... 로댕[11]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을지 궁금하네.
기하: 아까 책 보다가 로댕이 모델이랑 있는 사진을 보고 웃겨서 찍어놨어. 모델을 완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시켰을 것 같은 느낌이야.
정의: 또 생각나는 일화는, 언제 친구가 작업실에 놀러 와서 온종일 주구장창 드로잉을 한 적이 있어. 계속 드로잉을 하니까 굉장히 지겹고 피곤해 보였는데 무시하고 계속했거든? 마지막에 가서는 눈에 힘이 다 빠지고 머리를 계속 쓸어 넘기면서 너무 지친 표정이 됐는데, 그때 너무 재밌었어.
기하: 대작가라면 그럴 때 화내야지. “이게 지금 장난이야?” 이러면서.
정의: 모델링이 무슨 장난이니? 여하간 나는 모델을 그릴 때 뿐 아니라 조각을 만들면서도 나와 조각 사이에 텐션이 있어야 더 재밌는 것 같은데. 너도 조각을 만들 때 그런 텐션을 느껴?
기하: 응. 난 조각을 만드는 게 나의 종교 같다는 생각을 했어.
정의: 너의 종교?
기하: 응. 이걸 만듦으로써 계속해서 살아있다고 느끼고 내가 살아야 하고 존재하는 이유를 찾게 돼. 옛날부터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는데, 나는 아직도 죽음이 너무 무섭단 말이야? 죽음 뒤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니깐. 아까도 존 레논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존은 죽었지만 나는 그 사람의 인터뷰를 계속 듣고 있고 그 사람이 썼던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존재했던 그 사람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고, 또 이런 얘기를 남들한테 하면서 전해주잖아. 그러면 난 존이 죽은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 존이 정말 죽었다고 말할 수 있어? 그것처럼 내가 내 조각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자체가 내 존재의 이유인 것 같아.
정의: 그것보다 만드는 순간의 텐션은 없어?
기하: 난 ‘텐션’이라기 보다 어떤 ‘영접’을 체험한다고 생각하는데, 만드는 순간에 문신도 존도 지금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대화를 하거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내가 어떤 형태를 만들면 이것에 대해 뭐라고 할지 다 얘기를 나눠. 그럴 때 엄청 살아있음을 느껴. 넌 그런 건 생각 안 해? 난 작업할 때는 대부분 혼자 있고 혼자서 하나부터 열부터 해결해야 되니깐 내 자아를 나눠서 혼자 비서 놀이도 하고 기사도 되고 선생님도 되는 역할 놀이를 한단 말이야.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바로 옆에서 누가 의견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깐 혼자 상상을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일단 염두에 두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진행해.
정의: 그럴 때 그 결과물은 마음에 들어?
기하: 응. 난 내가 뭘 만들었을 때 ‘이건 좀 아니지’ 아니면 ‘이건 좀 선 넘었네’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게 들려. 그런데 가끔은 그중에 누가 싫어할 것 같아도 내가 본능적으로 괜찮다고 판단이 되면 그냥 해. 어쨌든 나는 내 작품을 평가받았으면 하는 사람들이 딱 있고 그 사람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은 내가 하는 걸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이 없어.
정의: 그런 사람들은 누가 있어? 문신? 이사무 노구치[12]?
기하: 그건 다 말할 수 없지.
정의: 존 레논도 있는 건가?
기하: 당연하지. 나는 진짜 존이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 문신이나 노구치 같은 사람은 사실 내 안에 있다고는 생각 안 되고 나를 지켜보면서 혼낼 것 같은데, 존은 나야.
정의: 그러면 적어도 네가 말해줄 수 있는 그 작가들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면, 그 상황에서 네가 떠올리는 건 뭐야? 그 사람들의 작업? 생전의 작업 태도?
기하: 그냥 인생 전반적인 거지. 내가 누구의 작업을 좋아한다는 건 결국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 아닐까? 작업은 어쨌든 그걸 만든 그 사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잖아. 그 사람의 생각과 태도와 그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의 모습.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구의 작업을 재밌게 보면 그걸 만든 사람이 너무 궁금해.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는 것도 좋아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는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 진짜 멋있는 영화를 보면 이 감독은 얼마나 미친 새끼길래 이런 걸 만들었을까 궁금하고, 그 감독과 같이 일하거나 연애하는 상상도 하고. 넌 안 그래?
정의: 네가 말해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작업을 본다 해도 이 작가의 성격이 어떤지, 그런 점을 딱히 궁금해한 적 없는 것 같아.
기하: 나는 좋은 작업을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생각들을 하길래 이런 걸 만들었을까 싶은데. 오히려 외국 작가면 환경이 나랑 다르니까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본 게 어쩌면 당연해서 덜 궁금한데, 한국 사람이면 더 궁금해져.
정의: 아. 나도 그런 걸 궁금해한 적이 몇 번 있긴 하다.
기하: 잘생긴 사람? 근데 확실히 잘생기면 더 궁금하긴 하지. 그거를 다 어떻게 떼놓고 볼 수가 있겠어. 다 총체적인 것을 구성하는 요소인 건데.
정의: 그렇지.
기하: 남자는 아까 말한 그런 섹슈얼 텐션으로서 궁금해지는 것도 있는데, 반면에 여자는 나랑 같은 여자니까 같은 편의 입장에서 더 궁금해지는 것도 있어. 나랑 비슷할수록 나랑 비슷한 환경에 있었는데 왜 이런 걸 했을까 싶은.
정의: 그러면 여성 조각가의 경우에 이입을 많이 해?
기하: 여성 조각가들이 특히 더 관심이 많이 가지. 그래서 한 명 한 명 만나보면 각자 다 너무 대단한 스토리들을 갖고 있어. 이 나라에서 사실 여성이라는 것을 의식하지 않은 채 조각을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면 모두 ‘여성’이라는 것에 대한 사유가 깊고 그 개념과 사투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리고 비교적 남성들에 비해 자기객관화가 잘 되어있어.
정의: 네가 조각을 하면서 그런 것을 가장 의식하게 되는 순간은 언제야?
기하: 아무래도 체력적인 면. 그런데 나도 처음에는 남자랑 여자랑 체력적인 차이가 엄청 클 거라 생각했는데, 사실 우리가 무조건 몸으로만 작업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너와 내가 둘이서 같이 똑같은 작업을 10시간 한다면 우리도 체력적으로는 똑같이 힘들 거라고 봐. 그런데 차이는 환경적인 면에서 온다고 생각해. 남자들은 자연스럽게 남성 중심적인 네트워크에 소속되고 선후배 사이나 교수와 제자의 관계도 지네들끼리 잘 짜여져 있으니까 작업을 하면서 도움을 받고 정보를 요청할 때 수월해서 작업을 더 쉽게 할 수 있지.
정의: 체력 얘기가 나온 김에, 나는 작업을 하면서 신체적 한계가 느껴질 때 ‘팔이 3개였으면 좋겠다, 세 개의 팔로 하는 조각은 어떨까?’, 아니면 눈의 위치를 바꾼다든지 같은 생각을 하곤 하는데 너는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어?
기하: 난 그것보다 오히려 걱정을 많이 해. ‘내가 이 돌에 깔리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하다가 팔이 잘린다면? 팔이 잘렸을 때 조각은 어떻게 만들까?’ 너처럼 팔 3개를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팔이 하나일 때도 조각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정의: 네가 조각을 만들 때 드로잉이 없이 몸에 반응하는 형태를 만든다고 했는데, 너의 작업을 내가 만든다고 상상해봤을 때 드로잉이나 어떤 머릿속의 구체적인 상이 없이는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을까 싶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세우고 하는지, 그런 과정이 궁금해.
기하: 구체적으로 플랜을 세우지는 않는데 내 머릿속에 포스트 보드가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어떤 전시를 갔는데 너무 멋있는 게 있으면 그게 딱 머리에 박혀서 그 보드에 핀이 꽂히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거 보다가도 꼭 조각이 아니더라도 멋지거나 끔찍한 책을 읽거나 영화를 봤으면 그 개념이나 느낌에 핀을 또 꽂고. 그런 것들이 총집합돼서 형태가 도출되는 것 같아. 드로잉을 하긴 하는데 내가 만드는 조각에 대한 드로잉은 아니야.
정의: 영감을 얻기 위한 드로잉?
기하: 예를 들어 만들다가 어떤 형태로 만들고 싶은지 생각이 발전이 안 될 때 막 드로잉을 하다 보면 하고 싶은 게 생겨.
정의: 나는 드로잉을 할 때, 드로잉이 단순하게 조각으로 그대로 옮겨지지 않길 바라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강구하는데, 너는 드로잉을 할 때 이게 조각에 그대로 옮겨져 버리는 것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은 없어?
기하: 너한테 먼저 묻고 싶네. 너는 드로잉이 조각과 다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데?
정의: 현재는 드로잉을 겹쳐서 그린다든지, 나중에 내가 그걸 들여다보면서 파악해서 머릿속에서 다시 구성을 해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시도를 해보고 있어.
기하: 나는 애초에 드로잉을 정확하게 조각으로 옮기려고 하지 않아. 드로잉 속 조형들은 일단 그 안의 뼈대나 중력의 영향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리는데 실제로 만들다 보면 제작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원래 즉흥적으로 형태들을 만들다 보니 원래 계획과는 많이 달라져.
정의: 가끔 조각가가 한 드로잉을 보면 ‘이건 조각가의 시점이다’ 라는 게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다 화가들의 드로잉을 보면 무게나 중력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나는 드로잉을 할 때 나도 모르게 중력이나 뼈대를 인식하는 게 느껴질 때가 있어. 너는 그게 철저하게 분리가 돼?
기하: 아니. 생각해보니 나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 항상 뭔가 다리의 밸런스를 생각하면서...
정의: 맞아.
기하: 슬프다.
정의: 진짜 슬프다. 그래서 나는 드로잉할 때 중력 같은 걸 가끔 무시해 보려고 할 때도 있어.
기하: 그러면 중력을 무시하고 한 드로잉은 실제로 조각으로 다시 옮길 때는 어떻게 돼?
정의: 그때는 다시 중력을 고려하면서 바뀌지 않을까?
기하: 그렇지만 시도 자체가 멋있네.
정의: 응. 그래도 그런 걸 시도해 보는 건 재밌는 것 같아.
기하: 한국 축구 같은 거네. ‘졌잘싸’. 졌지만 잘 싸웠다.
정의: 난 네가 이번 전시에 낼 부조 작업이 드로잉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 작업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했어?
기하: 팔려고. 돈 벌려고. 나는 여태 작업을 하면서 작업의 판매를 아예 염두하지 않았었는데 요즘 서서히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위기감이 들기 시작했거든. 이래서는 오래 못 가겠다 싶으면서. 지금 미술 시장도 핫한데 왜 나는 이걸 남의 이야기처럼 보고 있는 건지, 나도 내 조각을 팔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각성을 하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시도로써 판매 가능한 작품을 만들어보려고 한 건데, 보통 조각을 판매한다고 생각하면 크기를 줄이잖아. 그런데 나는 작은 조각도 되게 판매하기 어렵다고 생각해. 조각은 점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조각만큼만 자리를 비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주변의 공간까지 조각에게 내어주어야 하는데 그런 디스플레이는 한국의 주거 조건과 잘 맞지가 않잖아. 그래서 나는 무조건 벽에 걸 수 있는 걸 해야겠다 싶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조를 생각하게 되었고 석고로 판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드로잉을 하듯이 막 형태들을 깎았어.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내가 드로잉을 할 때 해결할 수 없었던 부분을 해결해주고 있는 것 같아.
정의: 어떤 면에서?
기하: 드로잉은 어디가 튀어나오고 들어가는지 그 양감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어려울 수 있는데, 부조는 그런 걸 표현할 수 있고 석고의 다양한 텍스쳐도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 또 내가 이번에 크게 깨닫게 된 것은 ‘판매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작의 즐거움에 엄청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야. ‘이제 돈방석에 앉을 일만 남았어’라고 생각하며 흐뭇하게 작업을 하게 돼.
정의: 그럴 것 같아.
기하: 내가 돈 벌 궁리에 NFT도 조금 공부를 해봤거든? 근데 구경해보니깐 너무 끔찍한 거야. 인스타그래머블한 것보다 더 최악인 게 ‘NFT-able’한 거 같아. 너는 NFT 공부해 봤어?
정의: 아니, 안 해봤어. 그런데 내가 이해하기로는 NFT는 작품의 형상이랑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소유권에 관련된 거잖아. 네가 말하는 ‘NFT스럽다’는 게 그런 거야? 막 3D로, 시각적 효과 추구하는 거?
기하: 응. 괜히 멀쩡히 있는 조각을 gif로 만들어서 막 움직이게 만들고 요란한 효과랑 사운드까지 넣는 거. 정말 끔찍해.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져야 내가 하는 것의 중요성을 사람들이 더 잘 알게 되지 않을까 싶어.
⁂
정의: 네가 석조에 관심을 갖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해.
기하: 인간 실존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최고 보스는 돌 아닌가.
정의: 철조에는 관심 없어?
기하: 나 겁이 많아서 철조는 전기를 써야 하는 게 무서워.
정의: 전동 그라인더가 돌아가는 게 더 무서운 거 아니야?
기하: 그라인더는 되게 단순하잖아. 그냥 날이 회전 운동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것만 잘 컨트롤만 하면 되는데, 용접할 때는 기계도 잘 알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전기 세팅도 해야 되는 게 무서워. 그리고 전기는 한 번 잘못 쓰면 죽음이잖아. 예전에 학부 때 작은 키네틱 작업해 본다고 전선 연결하다 스파크가 확 튀어서 다리에 화상 입었던 적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철의 느낌이 싫어. 형태를 내 마음대로 하기가 너무 힘들지 않아? 돌은 그래도 그라인더 쓰면 자유자재로 잘 깎여.
정의: 나는 철조 수업을 들었을 때, 선생님한테 “선생님, 금속조는 덩어리에서 깎아내는 사람이 없나요?”라고 물었더니 “철은 무게가 곧 돈이란다” 라고 하시는 거야. 그때는 ‘그렇구나. 맞는 말이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비단 철조뿐 아니라 조각의 모든 것이 무게가 곧 돈인 것 같아. 버리는 것도 돈, 사는 것도 돈.
기하: 그렇지. 그걸 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조각을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어. 석고는 그래도 버릴 수라도 있지, 돌은 버리지도 못해. 전에 깎다 남은 돌조각을 버리려고 어떻게 폐기하는지 검색해봤는데, 인터넷으로는 정보가 안 나와.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물어봤는데, ‘돌’을 버린다고 하니깐 처음 듣는 것처럼 엄청 당황하면서 다른 데로 전화 연결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어디 업체에 연결돼서 거기에서 트럭에 돌을 싣고 갔는데, 내 생각에는 거기도 그냥 가져가서 강가나 산에다가 돌을 유기하는 게 아닐까 싶었어.
정의: 공짜였어?
기하: 아니? 돈 많이 들었지. 40만원. 깎고 남은 돌만 한 500kg이었어.
정의: 나도 전에 석고 폐기할 때 나온 게 500kg이라니까? 50kg짜리 10포대 이상을 버렸어.
기하: 그래도 나는 석고 버릴 때 마음이 후련해. 왜냐하면 작업실에 계속 내가 석고를 주문할 때 이게 그냥 온다고 해서 다 반가운 게 아니라, 작업실도 결국엔 언젠가 이사를 해야 하니깐 얘네들을 언젠가 나중에 또 이동시켜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프거든. 석고 포대 하나 옮길 때만 해도 되게 힘드니까. 그래서 ‘버린다’라는 홀가분함은 있어. 좀 슬프지?
정의: 또 궁금한 건, 첫 번째 개인전 ‹Vanilla› 때 조각에 대한 질문들을 던졌잖아.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스스로에게 좀 답이 됐는지, 그 이후에 바뀐 생각이 있는지?
기하: 엄청 많이 바뀌었어. 특히 여성적인 조각에 대해서는 일단 그 질문을 내가 계속 끌고 가면서 더 디벨롭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
정의: 그러면 지금 가장 집중하고 있는 질문은 여성적인 조각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거야?
기하: 집중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 중 하나지.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내가 여성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여성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있었어.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만든 걸 보니까 너무 여성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그 ‘여성성’이 정확히 뭔지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어. 그래서 이게 과연 뭘까, 나의 이 여성성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더 잘 보여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 것 같아. 난 여성만의 감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야.
⁂
기하: 이 전시의 제목이 ‹조소의 즐거움›인 만큼, 조각을 만드는 데 가장 즐겁지 않았던 최악의 순간에 대해서 말해봐.
정의: 최악의 순간... 작년에 ‹사람 모양 재료› 전시에 출품할 작업을 만들 때 원래는 아이소핑크를 깎은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석고를 붙이는 게 아니라, 아이소핑크를 석고로 캐스팅하려고 했어. 그런데 캐스팅을 다 하고 나니까 너무 무거워서 들지 못했을 때. 그때 굉장히 좌절감이 컸어.
기하: 다른 사람이랑 같이 들면 되잖아?
정의: 그게 말이 안 돼. 생각은 해봤는데, 매일 옥상을 오르락내리락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람을 매일 부를 수도 없잖아. 그리고 얼마 전에 석고 폐기물 버리는 날에 현타가 심하게 왔었어.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버릴 때 항상 현타가 오나 보다. 물질이어서 재밌지만 물질이어서 현타가 온다.
기하: ‘No pain, no gain’ 인 거지 뭐.
정의: 그때 책임감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기하: 나도 돌 조각들 철수할 때 딱 그 마음이었다니까.
정의: 진짜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이렇게 다 허비를 했지? 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500kg를 여기다 쌓아놨지?’
기하: 나도. ‘무슨 생각으로 이런 몇 톤짜리 돌을 깎은 거지?’ 그런데 그런 건 있어. 당시엔 너무 짜증나는데 나중에 또 그리워. 뭔지 알아?
정의: 아니, 몰라.
기하: 몰라? 작업하면 너무 육체적으로 힘들잖아, 그런데 그걸 또 안 하면 하고 싶어지지 않아?
정의: 그렇지. 하고 싶지.
기하: 나도 돌 깎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항상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데, 운동할 때도 할 때는 힘들지만 하고 나서는 뿌듯하잖아.
정의: 난 운동을 안 해서... 그렇다면 반대로 너의 경우 조각을 하면서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기하: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내 작업을 보러 왔을 때가 제일 짜릿한 것 같아. 작업 좋다고 평소에 생각했던 사람이 내 전시를 보러 오면 정말 기뻐. 그 사람이 내 작업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왔다는 것 자체가 좋아. 나도 그 사람의 삶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는 거잖아. 인간은 다 하나야.
정의: 그러면 이번 전시에 가장 왔으면 좋겠는 작가님, ‹조소의 즐거움› 전시에서 가장 뵙고 싶은 작가님 이름을 한번 말해줘.
기하: 이불.
정의: 이불 작가님. 진짜 좋겠다.
기하: 그런데 이불 작가님 전시 보셔?
정의: 그런데 이건 조각의 즐거움은 아니라 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즐거움이라고 볼 수 있잖아. 돌아가서 조각 제작할 때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기하: 나는 돌 작업할 때 땡볕에서 개고생할 때. 작업하는 곳이 폐가 같은 데라서 제대로 앉아 있을 데도 없고 먹을 데도 없고 커피 한 잔 할 수가 없는 환경이라 아예 쉬는 시간이 없이 해. 그리고 집에서 차로 한 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와 있는 시간 동안 최대한 뽑을 걸 뽑고 가야 한다는 생각에 최대치로 집중해서 해. 그렇게 막 땀 흘리며 개고생을 하고 온몸이 돌가루 범벅이 된 상태에서 집에 가서 샤워하고 위스키 한 잔 딱 마실 때가 제일 즐거워.
정의: 그것도 제작의 측면이 아니잖아. 집에서 술 마실 때가 제일 좋다는 거잖아.
기하: 아. 또 실패네. 이것도 있어. 내 돌 조각들이 지금 다 충주에 있는 부모님 댁 마당에 있어. 그런데 거기를 거의 안 가고 일 년에 두세 번 정도만 가는데, 언제 봄에 한번 갔는데 내 돌 조각 주변으로 꽃이 엄청 핀 거야. 그 위에 나비도 앉아있고. 잔디가 무성하고 새가 지저귀는 자연 속에 있는 내 돌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 조각을 만들 때는 항상 황량한 곳에서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나와의 사투를 마치고 평온한 자연으로 돌아간 듯 보여서 너무 멋있었어. 황홀했어. ‘내가 이런 멋진 걸 만들었단 말이야?’ 하면서.
1. 존 레논: John Lennon, 1940-1980.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평화운동가. 록밴드 비틀즈의 전 멤버이자 오노 요코의 전남편.
2. 권진규: 權鎭圭, 1922-1973. 한국의 조각가. 대상의 외양보다는 본질과 정신을 표현하는 인체 구상 조각을 주로 제작했다.
3. 직조: 直塑, Direct sculpting. 캐스팅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재료를 붙이고 깎아 완성하는 조각의 제작법.
4. 가다: 型(かた). 거푸집, 틀, 형틀.
5. 문신: 文信, 1923-1995. 한국의 화가, 조각가. 자연과 생명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대칭성을 지닌 기하학적 추상 조각을 제작했다.
6. 폴리: 섬유강화플라스틱. FRP(Fiberglass-reinforced plastic).
7. 자코메티: Alberto Giacometti, 1901-1966. 스위스 태생 프랑스 조각가. 인간의 실존을 탐구하는 인체 조각을 만들었다.
8. 최의순: 1934-. 한국의 조각가. 전직 서울대 조소과 교수. 석고 직조를 이용해 추상 조각을 만든다.
9. 초경석고: 超度石膏, Ultra hard gypsum. 경화 후 경도가 우수한 석고.
10. 테라코타: Terracotta. 점토를 700-800도 가량의 온도에 초벌 구이해서 만든 토기류.
11. 로댕: Auguste Rodin, 1840-1917. 프랑스의 조각가. 현대 조각의 개척자.
12. 이사무 노구치: Isamu Noguchi, 1904-1988. 미국의 조각가, 인테리어 디자이너, 조경사. 브랑쿠시의 제자로 돌과 나무를 이용한 추상 조각을 제작했다.
Nov. 2021/ 돌 조각의 조건: 홍기하 작가를 만난 후 / 김솔지
김포시 대곶면 작업장에서 홍기하 작가가 작업하고 있는 대리석 조각 (촬영: 김솔지)
돌 조각의 조건 : 홍기하 작가를 만난 후
김솔지
김포시 대곶면, 홍기하 작가가 작업하는 장소를 찾아갔다.(1) 평소 가보던 도시 ‘김포’보다는 ‘강화’에 가까운 곳이었다. 좁은 길 하나로 컨테이너를 실은 덤프트럭이 지나갔다. 그 길을 따라 가다 보니, 폐가가 보였고 마당에 커다란 옅은 코랄 빛의 돌 조각이 있었다. 이 마당에서 조각 작업을 하는 홍기하 작가를 만났다. 작가는 등받이가 없는 작업용 플라스틱 의자에, 나는 오래되 짐이 이리저리 방치된 나무 벤치에 엉덩이를 살짝 걸쳤다.
작가의 첫 질문은 올해 만든 돌 조각 세 점으로 전시를 할지, 말지 였다. 신진 조각가가 돌 조각을 전시하는 일에는 몇 가지 물적 토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게차와 운송이라는 ‘작품 운송’ 토대가 하나이며, 조각을 든 지게차가 들어갈 수 있는 입구와 돌 조각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하중이 뒷받침된 ‘전시 공간’이 두 번째 조건이다. 세 번째는 공통조건이다. 저렴한 대관비와 지리적 접근성. 작가는 특히 지게차 진입 때문에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아닌 어느 곳에서 돌 조각 전시가 가능할지 궁금해 하며, 빈 터에서 작품을 전시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극서기와 극한기를 피해 야외에서 작업하는 ‘크고 무거운 조각’은(2) 봄, 초여름, 가을 이렇게 세 계절 동안 세 개의 작업으로 나왔다. 그는 농사를 마무리 짓듯이, 화강암 돌 조각에 이어서 현재 하는 대리석 돌 조각 작업의 후반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조각들의 전시 공간을 찾는 일, 작업을 마무리한 작가가 해야 할 다음 작업이다. 나는 ‘여기가 전시의 ‘적소’에요.’ 라고 말하지는 못했다. 이 작업장의 형태와 유사하게 야외 공간과 전시 공간이 연결된 공공기관 두 곳을 말했다.
한 시간 넘게 이야기를 하니, 늦가을 바람에 몸이 점점 차가워졌다. 우리는 패딩 하나 걸치지 않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지 않고 그냥 돌 조각을 바라보며, 돌가루와 새소리가 섞인 교외에 앉아있었다. 나는 편한 의자 하나 커피포트 하나 없는 작가의 작업장이 신기했다. 작업하다 잠시라도 편하게 쉬지는 않는 것인지 물었다. 작가는 여기서는 오로지 작업만 한다고 했다. 쉬는 시간까지 줄여서 압축적으로 작업에 온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고, 차를 타고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는 것이다. 운전을 못 하던 그가 운전을 배워, 소위 중소기업들의 동네에서 작업만 하는 일. 이는 작가가 가진 토대에서 조각하기 위한 균형이다. 돌 조각을 하기 위한 작업장의 조건, 야외 공간이 있어야 하며, 주변 소음 민원이 없어야 하고, 가루 분사로 직접적으로 피해 받는 사람이 주변에 없고, 지게차가 들어와 작품을 실을 수 있어야 한다. 저렴한 비용에 이 조건을 충족시키려면, 다른 조건들, 이를테면 바람을 피할 공간, 컴퓨터를 올려놓고 잠시 사무 작업을 할 책상, 깨끗한 화장실, 휴게 공간이나 싱크대는 부수적인 것이 되고 만다.
조각을 전공한 작가는 왜 하필 ‘돌’ 조각을 하는 것일까? 돌 조각의 ‘조건’은 작가 입장에서는 ‘한계’일 수 있다. 작가가 돌 조각을 하기로 한 일, 여러 종류의 돌을 가지고 돌 조각을 하는 것, 돌 조각을 가지고 전시를 고민하는 일, 의뢰 받아 돌 조각을 해서 건물 앞에 세워두는 일과 관계없이 그저 돌 조각을 하는 일, 이 자체가 돌 조각가로서 자신을 명명하고 돌 조각을 하는 ‘돌 조각’ 작업이다.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미켈란젤로가 대리석 조각 <피에타>를 만든 것은 프랑스 추기경 장 빌레르(Jean Bilhères de Lagraulas)의 커미션이 있었고,(3) 로댕이 미완의 <지옥의 문>을 시작한 것도 문화부 차관 투르케(Edmond Turquet)의 주문이 있었다.(4) 홍기하 작가가 가장 좋아하는 조각가 브랑쿠시(Constantin Brâncuși)는 어떠한가? 로댕의 제자였던 브랑쿠시는 비콩트 드 노아이유(Vicomte de Noailles)로부터 그의 <공간 속의 새> 확대 버전을 주문 받아 제작했으며, 자신의 조각을 변형하며 제작하는 ‘예술 산업적’ 방식을 보여주었다.(5) 이처럼 무겁기 때문에 운반과 제작, 전시, 보존이 모두 녹록지 않은 돌 조각은 자본주의 시대에는 더욱 더 ‘자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 사회적으로 보통 돌 조각가는 빌딩 앞 조각을 의뢰받거나 용역을 수행하는 조형물 제작자의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다. 거대하고 무거운 돌 조각 작업은 ‘의뢰’라는 교환관계가 약속될 때에나 수월한 것이다.
그러나 홍기하는 지금은 어떠한 주문과 의도도 없이 작업하고 있다. 올해 마포문화재단의 <업사이클>에 선정되어 받은 지원금보다 돌 하나 값이 더 나간다. 그는 자본주의라는 사회 질서를 정면으로 마주하며 돌 조각을 하고 있다. 사회적 질서가 그의 뒤에서 그를 조종한다면, 그가 바라보는 곳은 돌이다. 그의 조각은 자신이 작업하는 시간 동안 돌을 마주 보는 일, 대화하는 일, 관계 맺는 일이다. 그는 돌과 친해진다고 말한다. 그 과정에서 나온 돌 작업은 감상자와 적은 말로도 이해할 수 있는 관계 맺기를 지향하는 듯하다. 최근 기획전 《Peer to Peer》(기획 고안철)에서 본 홍기하의 석고 조각 <Flesh>에서도 나는 어떤 서사나 메시지보다, 91cm 높이의 얇은 석고 조각에서 그저 날렵한 에너지, 조명을 맞을 때 한층 더 기세등등한 표현과 이를 담지한 내용을 느꼈던 것처럼 말이다.
화강암이나 사암, 대리석 등 홍기하가 지금껏 선택한 돌은 작가 자신이 선택한 ‘재료’이다. 재료가 되기 전에는, 인간이 어디선가 채석해 상품으로 파는 지구의 ‘자원’이다. 그 이전에는 유구한 세월이 쌓여 ‘덩어리’가 된 지층의 일부다. 그는 이 물질과 한정된 시간 동안 관계를 맺는다. 돌보다 더 짧은 생을 살기 마련인 인간으로서 유구한 자연사적 물질과 관계 맺는 그의 작업은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그 자체로 보여주는 듯하다. 한편으로 홍기하는 수억 만 년의 역사를 정으로 내리치고, 그라인더라는 기계장치로 도려내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다른 한편으로 오랜 자연의 파편 앞에 선 또 하나의 자연으로서 일대일로 나눈 무언의 대화를 기록한다.
홍기하가 조각가로서 돌 조각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그가 조각하는 조건이 지속되는지와 유사하다. 지금 사용하는 그의 임시 작업장이 허물어지면, 그의 조각 작업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그는 예술로서 돌 조각을 일로써 돌 조각과 계속 분리할까? 그는 앞으로 어떤 재료와 관계 맺을까? 나는 현실적 조건이라는 돌풍에도, 언제나 돌처럼 자신의 중심을 지니고 있는 그가 새겨나가는 조각을 지켜보고자 한다. 그의 조각이 전달하는 것들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1) 2021년 11월 15일 진행된 홍기하 작가와의 대화를 정리한 이 글은 마포문화재단 지역문화팀의 <업사이클> 사업의 일환으로 작성되었다.
(2) 홍기하 작가의 표현을 따랐다.
(3) 포드햄대학교 미술사 교육 웹사이트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의 역사 항목 참고. (검색 2021년 11월 17일) https://michelangelo.ace.fordham.edu/exhibits/show/vatican-pieta/vatican-pieta-history
(4) <르몽드> 프랑스판 2012년 1월 2일 기사 <Rodin nous ouvre « la Porte de l’Enfer »>참고. (검색 2021년 11월 17일) https://www.lemonde.fr/arts/article/2017/01/02/rodin-nous-ouvre-la-porte-de-l-enfer_5056336_1655012.html
(5) Hal Foster ... [et Al.], Art since 1900 : Modernism, Antimodernism, Postmodernism, (New York: Thames & Hudson, 2011), p. 230.
Oct. 2021/ 매스와의 격투, 조각의 가능성 Fighting Mass, The Potential of Sculpture / 홍기하 Khia Hong
매스와의 격투, 조각의 가능성 / 아트인컬처 2021년 10월호
작가노트, 작업설명, 전시기획서 등을 작성하다 보면 ‘조각의 가능성’이란 묵직한 말을 여기저기 촐싹대며 쓰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조각에서 가능성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로는 엄포를 놓지만, 정작 손과 머리로는 그래본 적이 있던가? 돌이켜보면, 오히려 조각에 절망을 느꼈던 순간이 더 많이 떠올라 잠시 마음이 착잡해진다. 전시를 앞두고 완성된 작품을 넘어뜨려 산산조각 난 작품과 마음을 다시 봉합했던 시간, 한파 속에서 유해 물질을 쓰며 깎여 나가는 수명을 실시간으로 체감했던 기억, 2톤짜리 돌을 지게차로 들어올리다 끈이 끊어져 심장이 멎을 뻔한 순간.... 이런들 무슨 가능성이냐고 쏘아붙인다면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을까.
몇 달 전 나는 전시 기간 한 달 동안 전시장 앞 야외 공간에서 돌을 깎겠다는 다소 호기로운 계획을 세웠다. 결과물이 아니라 조각을 만드는 과정을 관객이 볼 수 있다면 작업에 대한 이해도가 확연히 달라지리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 시간이 며칠이 넘어 몇 주가 되고, 오는 사람들마저 전동 그라인더의 찢어지는 굉음과 사방에 흩날리는 돌먼지를 피해 멀찌감치 잠시 훑어보고만 가니 잡념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한참을 멍하니 있자니 근처의 노동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내가 돌을 깎고 있던 곳의 바로 10m 건너편에서는 주차장 공사가 한창이었는데, 처음엔 휑하던 흙바닥이 며칠 만에 깔끔한 차도와 인도가 되었던 것이다. 순간 죄책감이 몰려왔다. 나는 ‘진짜’ 노동 앞에서 가짜 노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술을 한답시고 돌을 쪼고 있는 나의 행위가 무의미하다는, 그리고 저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생각에 작업이 쉽사리 손에 잡히지 않았다.
한번은 미술계 분들에게 이러한 고민을 털어놓았다. 공감되지 않을까 싶어 이야기를 꺼냈는데, 그분들은 미술계에 족히 삼십 년은 계셨던지라 나의 이야기를 귀엽다는 듯이, 아니면 다소 한심하다는 듯이 듣는 표정이었다. 그러고는 한 분이 말씀하셨다. “저기요. 차도에는 120km로 달리는 차도 있는 반면 60km로 달리는 차도 있어요. 느린 차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는 차들이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술가는 사회의 그런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단번에 이해되는 비유였다. 그리고 내가 본 수많은 브레이크, 즉 조각가 동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최근 들어 조각가들의 작업 환경에 관심이 생겨 여러 작업실을 방문하고 있는데, 몇몇 곳은 눈물 없이는 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같이 열악하고 참혹했다. 흙 한 덩이 옮기기 전에 열 번 더 고민해야 하는 위협적인 계단, 곰팡이와 승산 없는 사투를 벌이는 연약한 환풍기, 얄팍한 비닐로 좁아터진 공간을 쪼개는 파티션,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한 조각에 긁힌 통곡의 벽, 쌓이고 쌓인 조각에 수장고로 변모한 테이블.... 기가 막힐 정도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을 보면 즐겁게 놀러온 마음은 금세 숙연해지고 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걸까? 조각의 크기를 줄인다면, 재료를 바꾼다면, 작업을 다 갖다 버린다면, 아니, 그냥 조각을 하지 않는다면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 아닌가?
그렇지만 다시 그들의 표정, 그리고 함께 나눈 대화를 떠올려보면 결코 어둡거나 암울하지만은 않았다. 에어 컴프레서를 사용할 수 없는 어려움에 대해 울분 섞인 열변을 토하지만, 또 그것을 어떤 신박한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 머리를 맞대고 찾아 나선다. 새로 주문한 몇 백 키로의 재료를 옮기고 넘긴 무용담을 들으며 연민과 존경심을 느낀다. 조각들 뒤에 숨겨진 시행착오와 사연, 그리고 그것을 만든 이의 반짝이는 눈빛에서 조각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조각의 정의와 고유한 영역이 애매해진 지 오래된 지금, 우리는 다시 ‘조각’이 무엇인지 찾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정해진 답이 없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은 꽤나 외롭고 수고로울 수밖에 없다. 사회가 최고의 효율과 경제성으로 향하는 매끈한 길을 따라 달려갈 때, 조각가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천천히 파내고 있다. 다시 공사장 옆에서 돌을 깎던 때로 돌아가자면, 오랜 고심 아래 조금씩 덩어리를 잘라내던 내 모습을 보고 공사장 노동자들은 그걸 어느 세월에 깎냐는 핀잔과 함께 돌을 더 효율적으로 잘라낼 수 있는 방법과 공구를 추천하곤 했다. 물론 그 방법대로 한다면 내 조각은 훨씬 더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완성’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사실을 나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추구하는 것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것이 조각인 게 아닌가.
며칠 전 새로운 작업에 들어갈 돌을 찾으러 갔다. 지난번에 돌을 깎으며 느낀 체력적 한계와 돌에 깔려 죽는 상상에 시달린 이후로는 다시는 내 키보다 큰 돌을 깎지 않으리라 다짐했지만, 또 여러 돌을 둘러보니 매스의 육중함에 이끌려 웬만해선 만족스럽지 않았다. 쌓여있는 통석 사이에서 눈에 들어온 돌에 대해 문의하니 몸값은 200만원, 무게는 2톤이다. 예정된 예산과 무게는 이미 초과했고 역시 이것을 어디에 보관할지, 어디에 전시할지는 미지수지만, 걱정은 일단 제쳐둘 만큼 돌의 강한 기운에 못 이겨 일단 업어가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동료들의 눈빛을 기억하며 어떻게든 해낼 방법이 있으리란 확신으로 다시 조각의 가능성을 찾아 나선다.
홍기하 / 1994년생. 홍익대 조소과 졸업. 프로젝트 스페이스 영등포(2021)에서 개인전 개최/ <Corners 4: We Move We>(킵인터치 2020), <박하사탕>(별관 2019) 등 단체전 참여. 홍기하는 동시대 조각의 정의와 범주에 질문을 던진다. 거대한 돌과 석고를 깎으며 물성과 매스가 밋밋해진 조각의 경향을 정면 돌파하고자 했다.
Aug. 2021/ “VANILLA WAS HERE“ / 이유성 Eusung Lee
나는 회복 중이다. 매일 단어들을 줍는다. 사실 단어라 일축하기엔 서운한 감각들이지만, 만들기 위해 나는 더 확실하게 그것들을 느껴야 한다. 깎다, 껍질, 반 가른 무화과, 끼우다, 올려놓다, 찢어발겨 놓다, 보존하다, 뒤섞이다, 녹다, 내달리다, 터널, 없애다, 부스러기, 밀어내다. 복제하다, 워-터, 담긴다, 힘을 가하다 등등. 단어들이 수북히 쌓여 문장을 만든 후 사라진다. 일과가 끝나는 동시에 나는 텅 비어버리기 일쑤다.
홍기하 개인전 <Vanilla>, (프로젝트스페이스영등포, 2021)
나는 회복 중이다. 매일 단어들을 줍는다. 사실 단어라 일축하기엔 서운한 감각들이지만, 만들기 위해 나는 더 확실하게 그것들을 느껴야 한다. 깎다, 껍질, 반 가른 무화과, 끼우다, 올려놓다, 찢어발겨 놓다, 보존하다, 뒤섞이다, 녹다, 내달리다, 터널, 없애다, 부스러기, 밀어내다. 복제하다, 워-터, 담긴다, 힘을 가하다 등등. 단어들이 수북히 쌓여 문장을 만든 후 사라진다. 일과가 끝나는 동시에 나는 텅 비어버리기 일쑤다.
그래서 언제나 0에서 다시 시작해볼 수 있다. 어쩌면 그 훨씬 이전에서 부터. 조각은 내가 아무것도 몰랐던 때로, 누구와도 관계 맺지 않았던 시간으로 나를 계속해서 되돌려 놓아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조각은 개강 첫 날의 학교처럼 미지의 공간에 가까워서, 내가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확 내려놓는 것을 덜 두려워하게 만드는 일이다. 또한 조각은 기실 미적 사물을 칭하는 이름이기보다 그 단어가 구성된 방식(sculpt+carve) 그대로 일종의 만들기 행위를 일컫는 ‘동사’이기에, 장르라기보다 시간이고, 신체라기보다 공간이다. 글은 대체로 문단들을 촉촉한 흙으로 붙이고 떼어가며 홍기하가 묻는 ‘조각’과 그의 시도를 살피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사족 없이 시작할 수 없을 만큼, 진행 중인 작가의 작업과 생각들을 출발점으로 글을 쓰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국 쓰기로 한다. 나 또한 근원적으로 동사이며, 시간이며, 공간인 것들을 그러모아 만들고, 연결하는 과정 안에 함께 있음을 느끼기 때문에.
여태까지 미술이라는 업을 시작하고 경험한 짧은 시간 동안 바뀌게 된 한 가지 인식은, 설계된 시간만큼 작용하고 사라지는 것들의 구조와 그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잊힘, 잃어감, 녹슮, 무너짐, 색바램, 사라짐 등 축축하거나 막막하고 슬픈거라 여겼었고, 때론 나를 분노케도 만들었던 단어들에 가졌던 감정적인 필터들이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 녹아내려 자연스럽게 그 꼴이 바뀐 것으로, 이 인식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것 같다.
처음 홍기하의 전시장에서 본 조각들의 형상과 그가 전시를 위해 작성한 머리말이 직관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 몇 달 후 홍기하가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던졌던 질문 목록이 내게 던져진 질문이 되었을 때, 그의 ‘바닐라’들과 그것을 만들게 한 몇 개의 진지한 질문들이 서로의 갈라진 틈 사이로 스며들어 거의 협착된 덩어리로 보였다. 당장 이것의 미술적 의미를 정리하는 것보다, 작가의 인식의 변화를 살피고 그의 질문들 주변을 거니는 것이 지금 내게 마땅하고, 사실은 더 매력적인 일이다. 과거 요소들과의 단절과 덮어쓰기가 일어나는 시간을 찾기 위해, 일베 조각상이나 그가 작업했던 희극성을 띤 짧은 영상들까지 혼자 거슬러 올라가 보았다. 한 작가에게 그 의도치 않은 변화의 시간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테니까. ‘바닐라’ 연작(2021)에 대한 글은, 다행히도 그의 근과거의 글 ‘오스티아 안티카의 미네르바 여신상을 제작한 조각가에게’*를 톺아 시작해볼 수 있을 것 같다.
*2019년에 오스티아 안티카의 석공에게 시공간을 초월해 썼던 편지
1. 영원함에 대하여
전시 ‘박하사탕’(참여작가: 김문기, 홍기하, 별관, 2019)에서 홍기하는 약 2000년 전에 조각을 만든 석공에게 쓴 편지를 내보인다. 2017년, 로마의 팔이 잘린 초라한 석상 앞에서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아득한 시간에 접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물의 속성에 주목한다. 솔직하고, 뜨겁고 또 차갑기도 한 이 글은 ‘돌’이 홍기하에게 삶의 유한함을 넘어설 수 있는 마지막 보루로 인식된 과정을 전달한다. 애리조나의 관광도시인 스코츠데일에는 기술발전이 가져다줄 영생에 대한 희망을 전제로 뇌나 전신을 냉동시켜 보관하는(장사를 하는) 연구소가 있을 정도로 ‘불멸’과 ‘영속성’에 대한 집중은 필멸의 존재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히 호응할 수 있는 감정이다. 여전히 운명에서 축제가 되지 못한 두 글자. 이것이 자연의 섭리라며 ‘서구문명의 고질병’, ‘현대예술의 허무주의’처럼 거푸집에서 떠내는 금속성의 말들은 언제까지 인간을 가르치려 할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자연은 친밀해서 으슬으슬한 관계들과 그 진실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각자의 가장 값진 파편을 남기길 원한다. 거울 앞을 떠난 뒤에도 그 안에 거울상이 남아있기를 바라는 것. 그게 제일 기이하단 것을 망각하므로, 거울 앞에 우릴 닮은 무언가를 만들어 세워두거나, 다른 이들의 파편을 만지작거리기도 한다. 그 지난한 과정에서 ‘사라지는 것‘의 깊이감이 내게로 온전히 걸어올 때 까지.
기다림이 당장의 불안을 해소해주진 못하리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일까. 그 무엇 보다 사라짐과 잊힘에 물리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것. 이 부분이 홍기하가 현재 가장 적극적으로 마주 보고 있는 조각의 기본 조건이다. 분명 누군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공기나 물이나 흙의 형태로 잘 사라지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럼에도 죽음이 삶의 가장 뚜렷한 거울이며, 의미의 단호한 거름망이라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 현재형의 명제다. 이제 홍기하는 돌이라는 재료의 극단적인 비효율성에서 다시 한 번 자신이 정의하는 ‘조각’의 의미를 찾아본다.
2. 효율적이지 않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
어찌 보면 조각은 어느 매체보다 계획을 세우고 효율에 대한 감각을 통과해야 지속할 수 있는 일이지만, 효율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결괏값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홍기하는 조각을 해나가기 위한 설득력 있는 답을 스스로 먼저 내어놓기 위해, ‘조각의 비효율적인 요소들 때문에 자본주의 시대에 조각이 가장 큰 가치를 지닌다’는 결론으로 살짝 점프해 조각이 놓여있는 시대를 관찰한다. 가볍고, 매끈하고, 기민하고, 영리한 것들의 찰나. 이 안에서 사람들이 조각을 하고, 보는 일에서 찾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느끼고 싶은 것은? 사실은 효율성까지 포괄해 넓게 균형을 이룬, 복합적인 리듬들이 곧 설득력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시대가 그 균형을 지나치게 무너트리는 곳이라면. 그 곳에서 비로소 그 목소리가 증폭되는 사물들도 분명 존재한다. (부디 가호를.) 사물이 가진 목소리를 듣는 방법은 모두가 알고 있다.
3. 하얀 사물들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사랑에 빠졌던 사물의 원형들. 그리고 몸을 가지고 대상의 비밀을 감지하는 일의 매혹적임. 그것들이 평생에 걸쳐 형태를 바꾸며 이전 사물들의 존재를 갱신해나간다. 이렇듯 조각적 대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은 사물을 경험하는 누구에게나 저마다의 정념이 존재하는 것이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것인 동시에 잘 표현만 된다면 사물은 곧 보편적인 언어를 공유할 수 있는 통로 형태로 활짝 열린다. 그러다 보면 손에 잡히는 형태 자체는 없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홍기하가 만든 백색의 석고 조각들은 표면적으로는 모더니즘 추상 조각의 존재 방식이나 조각가 문신의 석고 직조 체계를 일부 떼어와 복각해보고, 그 작가들의 삶의 태도와 사고방식을 가까이 들여다보기 위한 훈련으로도 보였다. 내가 아는 미술들을 지우고, 비가 퍼붓는 날에 갔던 문신 미술관을 잠시 지우고, 홍기하의 작업 앞에서 나는 직관적으로 무엇을 보는가? 하얗고, 자글자글하게 붙여지고, 두툼하게 사포질된 바닐라들은 표면 있는 그대로 어떻게 보이는가? 힘을 가진 이미지에 대한 우발적인 끌림들이 물에 적신 석고분으로 해석되고, 다시 결정화하는 모습. 조각의 힘이 작용하는 방식에 대해 여전히 남아있는 경외와 갈망과 호기심. 동시에 이 사물들이 어쩌면 모두 헛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진지한 의구심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만족감까지. 수많은 감각이 쌓여 덩어리를 이룬 오브제들이 제트래그를 겪는 표정들은 내게도 아주 낯설지는 않은 표정이다. 게다가 하얀 사물들은 언제나 내게 일종의 노트나 소설책처럼, 기입된 무언가 읽혀지길 기다리는 종이 더미를 암시하는 것이어서, 기회가 생기면 들여다보기를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들이다. 대부분의 단행본을 펼치자마자 있는, 짧은 헌사이자 사실상 책의 가장 간결한 초록인 ‘OO에게’가 적힌 페이지. 무의미로 채워 몸을 활성화하는 낙서종이. 앞쪽을 쓰다 중단된 다이어리. 서신용/소장용으로 한 쌍을 사는 미술관 엽서. 열심히 읽고 두 번 다시 들춰보지 않은 핸드아웃 뭉치들. 잠시 그 하얀 것들의 시간성에 내려앉았다가 돌아 나온다.
4. 지금 숨 쉬는 사람들이 모더니즘이 진지함에 부여한 형태들을 복각하지 않기를.
종종 시간에서 자유롭게 보이는 것들을 보게 될 때 마음이 열리는 것을 느낀다. 대상을 바라보며 빠져있는 그 순간에 나는 그 대상이 점유하는 생각의 공간만큼 존재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언제나 지나간 것들을 재고한다. 그러나 우리 중 대부분이 조각에, 진지함에 특정한 형태나 무게가 있다는 생각들을 여전히 벗겨내지도, 그렇다고 합의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판과 글로 남아있는 과거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일은,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으며 어떤 이데아를 지니고 사물을 빚어내고, 어떤 사건에 눈 떴으며, 어떤 일상 속에서 어떤 물질을 선택하고, 깎아내고 떠냈는지를 추적하고, 때론 사랑하고 또 몰아내는 장소다. 그 장소 중 하나의 예로써, 홍기하가 리스팅한 엄격한 조각 선생님 중 한 명인 이사무 노구치의 시공간을 떠올려보자. 노구치는 1987년 자신의 전시에서 미술관에 방문한 시각장애인 미술학도들이 작품을 만지면서 감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지금도 노구치 박물관에서는 이 방식을 지속해 ‘Touch’ 투어를 진행하고 있다. 분명 물질적으로 구체적인 몇 가지의 조건에 의해 가능한 일이다. 노구치의 조각 대부분이 만지거나 꼬옥 쥐더라도 닳거나 부서지지 않는 재료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많은 조각이 면과 면 사이의 모서리를 훑으며 지날 때 손을 다치지 않을 수 있도록 일정 정도 이상 부드럽고 두툼하게 각이 되어있다. 이걸 가지고 ‘조각이 역시 튼튼해야 한다.’거나 ‘윤리적인 접근’ 같은 얘기로 흘러가지 않기로 한다. 이런 선택지들을 그저 지긋이 바라봄으로써 그토록 조용히 딱딱하게 앉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사실은 어디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향해서 자신의 한계를 열어젖힐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는, 지금을 위해 다정하고 정중하게 가장 가차 없는 작별을.
5.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홍기하가 조각의 조건들을 숙고하며 설계해 놓은 ‘바닐라’ 묶음은 아직도 조금은 반사체에 더 가까워 보인다. 어쩌면 그 조건들이 사물들을 더 그렇게 보이게 하는지도. 그렇다면 끝까지 빈 칸으로 남겨놨던, ‘홍기하가 (지구가 존속한다면) 몇천 년 후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영원히 기억되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일까?’란을 채워볼 차례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었고, 그는 그 무엇보다 ‘I was here. 나 다녀감.’의 마음이 제일 먼저라고 답해주었다. 쾌감을 주는, 건조하고 깨끗한 대답이었다. 어느 선생님이 자신에게 ‘넌 무슨 70년대 조각을 하고 있냐’고 하셨던 말을 농으로 던지며, 그는 한동안 권태와 즐거움이 번갈아 뒤섞인 바닐라의 시간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바닐라들이 그에게 역으로 물어올지도 모른다. “영원은 차치하고, 내일도 넌 여전히 나를 사랑할 거니?” 몸과 마음으로 써 내리는 비약과 오답들이 인식을 확장하리라는 가만한 믿음이, 다만 우리를 움직인다.
Khia Hong Solo Exhibition <Vanilla>, (Project Space Yeongdeungpo, 2021)
I am in recovery. Every day I collect words. It might be unfair to dismiss them as mere words, but I need to approach them more explicitly in order to create. Carve, skin, half a fig, insert, mount, shred apart, preserve, jumble, melt, sprint, tunnel, remove, crumbs, shove. Duplicate, wa-ter, contain, force, etc. The words pile up into sentences, and they vanish. When the day's work is done, I am emptied out.
Therefore, I can always start over from zero. Or, maybe from further back. Sculpture allows me to revisit the point in time when I had no knowledge, or when I had no connections to anyone whatsoever. In other words, sculpture is much like an unexplored space—like the classroom on the first day of school—which allows me to be less hesitant to face the fact that I am clueless. Moreover, “jogak," the Korean word for “sculpture," signifies not only the term for aesthetic objects but also the verbs meaning "to sculpt" and "to carve.” In this respect, "sculpture" is more of a passage of time than a genre; a space than a body. This essay will mainly be sticking and scraping away bits of moist clay on the paragraphs to investigate Khia Hong’s notion of sculpture and her artistic practices. It is a burdening pressure to start off this essay with the artist's oeuvre and her thoughts. Nonetheless, I do not hold back as I also find myself to be a part of the process of raking up and connecting bits and pieces that are fundamentally a verb, a time, and a space.
One of the things that changed about my perception from my short experience in the art world and as an artist is that I got to have an understanding of the system of things that function for its designed amount of time and its beauty. I had once regarded them damp, helpless, and devastating like being forgotten or losing something to another, rusting away, being demolished, fading their colors, or evaporating into thin air. The emotional filters I had towards words that occasionally would be infuriating melted down over time into different shapes and forms. I cannot see myself going back to who I was before this change took place.
The sculptures and the text at Khia Hong's exhibition did not tap into my intuitions at first. A few months later when Hong's list of questions was thrown back at myself, her set of Vanillas and the earnest questions that became their motivation seeped through each other's cracks and solidified into a single clump. Rather than spelling out their artistic connotations at the moment, the more appropriate—and honestly the more appealing—approach for me to take is to examine the transitions in the artist's perception and to linger around her questions. In search for the discontinued and overwritten moments in the history of her past, I traveled back to the earliest of her works such as the Ilbe Sculpture or her short, comedic films. Nothing is more substantial to an artist than the moments of unintentional transitions. This discussion on the series Vanilla (2021) can start off, thankfully, from taking a close look at Hong's essay, To the Sculptor of the Statue of Minerva in Ostia Antica.
*A 2019 letter written to a sculptor of Ostia Antica in the remote past
1. On Perpetuity
For the exhibition Peppermint Candy (Artists: Moongi Gim, Khia Hong, Outhouse, 2019), Hong wrote a letter written to an unidentified sculptor who existed around 2000 years ago. Standing in front of an ancient, broken Roman statue in 2017, her attention heads to the materiality of stone in the respect that it can take her to a remote past. This candid, heated, and also icy letter illustrates the process of how "stone" came to be recognized for her as the ultimate matter that can overcome mortality. A research laboratory based in Scottsdale, Arizona preserves frozen human corpses and brains in the hopes of new future technology that will restore them to full health. This sense of obsession with "immortality" and "perpetuity" is not unfamiliar to mortal beings. The D word that is not welcomed in fate. How much more do we have to be unwillingly disciplined by metallic words like "the endemic issues of the Western civilization" or "nihilism of modern art"? After all, nature has always been an intimate but eerie presence.
As ever, we humans wish to leave behind the most precious piece of ourselves—wishing for the reflection to remain even after one has stepped aside from the mirror. Forgetting the absurdity of such desire, we place an object of resemblance in front of the mirror or fumble with remains of others, until the reality of mortality eventually walks toward us.
Maybe it's because we know too well that a wait cannot resolve immediate anxiety. Th ultimate physical defiance against perishment—that is the fundamental condition of sculpture that Hong is currently most involved in. For some people, all that they would desire would be to leave no trace in this world and preferably dissolve into thin air, water, or dirt. But death still remains the most apparent mirror of life and a resolute filter of meaning. Khia Hong attempts to find value in her own definition of sculpture from the extremely inefficient nature of stone.
2. The Value of Inefficiency
Sculpture, more than any other medium in art, needs a thoroughly devised plan and efficient measures in the process of its creation. However, being more efficient does not always lead to more intriguing results. To present a convincing argument for her sculptural practices, Hong jumps to a conclusion that sculpture "has the utmost value in a capitalist society as it is the least efficient act you can take upon.” In a world of light, slick, smart, and witty flashes, what are people trying to sculpt and find in what they see or sense? The most convincing case would be a well-balanced combination of complex rhythms, including the matter of efficiency. However, when society has failed to keep the balance, certain objects start to speak out. (God bless them.) And we all know how to perk our ears.
3. White Objects
The original forms of the objects we once fell in love with; the enthrallment of detecting secrets with one’s body. They transform throughout life and renew the presence of past objects. Likewise, as anyone who experiences objects each have their own way of building relationships with the sculptural subjects, objects retain the potential to become the gateway of sharing a universal language. Meanwhile, the physical form, per se, could vanish.
Hong's white gypsum sculptures ostensibly look to be practicing the modernist abstract sculptures and the sculptural language of Moon Shin's gypsum pieces, and they seem to take part in training to learn the life and philosophy of the late sculptors. Forgetting the art I know and setting aside the visit to the Moon Shin Art Museum through the pouring rain, what do my instincts say of Hong's work? What do I perceive from the white, bumpy, and furbished surface of the Vanillas? The impulsive attraction to the compelling images unraveled with gypsum paste and its crystallized form; the never-ending admiration, thirst, and curiosity towards the potential of sculpture; and at the same time, a sincere doubt that maybe all of this is only ephemeral; and the satisfaction as an artist. The jet-lagged looks of the objects packed with a myriad different senses are not too foreign to me. The white objects are a stack of paper, like a notebook or a novel waiting to be read; there is no reason for me to hesitate opening up the pages again. The acknowledgements page which is a short tribute and a brief abstract of the book; sheets of paper invigorated with meaningless doodles; a barely used diary; a set of museum postcards, one to post and one to keep; a bundle of handouts that have not been given a second look. I lay on the temporality of these white objects for a moment, and step out.
4. May the Living Depart From the Forms of Seriousness Given by Modernism
I find myself opening up to those that seem anachronistic. While indulging in their presence, I am able to exist as much as the intellectual space the object occupies. That is why people recall and reconsider past events. Yet it seems that most of us have still not gotten rid of, or even reached an agreement to the idea that there is a certain shape or weight to seriousness. Exploring the past through plates and texts is a business of backtracking, loving, and erasing what events people went through and what ideas they had or demonstrated, what kind of materials they chose, carved, and casted throughout their lives. Let's bring up the case of Isamu Noguchi—one of the sculptors Hong listed as her strict mentors. In 1987, Noguchi introduced a program for his exhibition where blind visitors could haptically explore his works of art by touching them with their own hands. The Noguchi Museum maintains this format for their blind or partially sighted visitors, calling it the Touch Tour. This is only possible under a certain set of conditions. Most of Noguchi's sculptures are made of a material that is solid and hesitant enough to withstand the grip of the hand. Also, the edges are round and soft enough to be safe for the sweeping hands. Let's not digress to the discussion on the engineering of sculptural structure or take an ethical approach to this matter. We can instead observe these choices to ponder upon to what extent the seemingly stiff-and-placid objects can fling open their limits toward people's minds. And for now, let’s bid a ruthless, but warm and polite farewell.
5.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The Vanilla series designed with Hong's own logic of sculpture seem yet to be reflectors. Or, the logic is pertaining to such appearance. And now would be the time to fill out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at is it that Khia Hong wants to deliver or leave to the people thousands of years in the future (if Earth should still exist then)?" I asked Hong point-blank, and she answered that more than anything it's the simple message of indicating, "I was here." A satisfying, dry, clean-cut answer. Joking that once her professor lectured her that she "shouldn't be stuck practicing 1970s sculpture,” Hong will, for a while, be having a vanilla time swirled with boredom and delight. Then, one day the Vanillas will turn their heads to ask her: "Forget forever.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Believing that the leaps and errors we write out with our body and soul will eventually expand our perceptions nonetheless motivates us, to keep marching on.
Nov. 2019/ 문신 선생님이 말하는 신생공간과 오늘날의 조각 / 홍기하
어느 날 늦은 새벽, 작업실에서 홀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멀리서 어떤 기운이 느껴졌다. 그 기운은 나에게 가까워지며 점차 구체적인 형상을 빚어냈는데… 이는 바로 조각가 문신(1923- 1995) 선생님의 혼령이었다! 어찌 된 일인지 처음에는 혼비백산이 되었지만, 선생님은 사진으로만 보던 온화하고 옅은 미소와 함께 당황하지 말라며 나를 안심시키셨고 계속하던 작업이나 이어 나가라고 하셨다. 그렇지만 선생님 앞에서 작업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법… 나는 이내 놀란 마음을 가라앉히고 황급히 자리를 정리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대화가 오고 갔으나, 문득 이 귀한 자리가 중요한 사료로 남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녹음기를 켰다. 이하 문신 선생님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이다.
홍기하(이하 ‘홍’): 선생님, 어찌 이런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찾아오셨습니까?
문신(이하 ‘문’): 하늘에 편히 있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내가 내 고향 마산에 있는 문신미술관을 94년도에 개관하고 그다음 해에 죽었는데, 누가 보면 저 노친네 원하는 거 다 이루고 떠났구나 할 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실은 난 화병이 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 마산시에서 미술관 주변에 아파트를 짓는다느니 뭘 한다느니 아주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도 많이 해서 내가 그놈들 꼴 보기 싫어서 이 세상을 떴어. 그런데 내가 없으니깐 아주 더 신나서 고층 건물 잔뜩 세우고 경관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하는데 그냥 하늘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있겠어? 하여튼, 이런저런 일로 세상 돌아가는 거를 둘러보다 보니 또 지금 세상 예술가들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작업실도 가끔 이렇게 돌아다니지.
홍: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이 있으셨군요. 돌아가신 이후로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 느끼시나요?
문: 물론이지. 작업하는 풍경만 봐도 참 많이 달라졌어. 여기도 조각을 하는 곳이라서 하는 말인데, 나 때는 조각가들이 자기 작품이랑 대결하듯이 극한 노동력과 정신력을 요하는 조각들을 했어. 그래서 나는 작업을 매일같이 했지만 가장 기력이 넘치던 때도 힘에 부쳐서 하루에 다섯 시간 이상은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 그런데 요즘 작업실에서는 어째서 그런 대결의 풍경을 볼 수 없는 건가?
홍: ‘대결’이요?
문: 풀어서 말하자면 작업과 씨름을 하는 태도랄까. 조각을 하다 보면 마치 내가 다루는 이 재료와 연애를 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석고는 가녀리고 예민한 여인과 같고, 흑단은 자존심이 세고 강단 있는 여장부 같아서 각각의 묘미가 있는데, 이러한 성격에 따라 내가 조각을 하는 태도도 달리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 내가 좋아하는 점을 존중하고 이를 북돋아 주는 것이 조각가로서 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인간이랑 연애하는 것과 같이, 그 과정이 좋게만 흘러갈 수는 없는 법이라서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고 다툼으로 관계가 더욱 성장하기도 하잖아. 그래서 조각을 하다 보면 이것이 말을 안 들어서 막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 류인(1)이 알지? 그놈 성격 보통 아닌 거는 익히 알고 있을 것이고. 걔는 작업할 때 신경질 나면 폴리를 그냥 맨손으로 퍼다 바르고 그랬어. 정신 나간 놈…
홍: 그쵸. 그렇게 재료랑 사투하지 않았으면 그런 조각들이 안 나왔을 것 같고, 선생님 연배의 모더니즘 조각가들은 재료랑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조각에서 느껴져요. 그런데 지금은 왜 그렇지 않으냐고 물으신다면, 일단 선생님 때는 주로 돌이나 브론즈같이 힘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전통적인 조각의 재료들을 다뤘는데, 지금은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지금 젊은 세대는 재료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본인이 다루기 쉬운 재료를 선택하는 것 같아요. 저도 비교적 힘들지 않고 돈도 덜 드는 재료를 선택하려고 해요. 물론 돌이나 나무 조각만의 간지는 분명 다른 재료로 쉽게 대체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문: 여자라면 이해는 가. 내 생전에 불란서에서 조각 심포지엄에 나갔을 때 여류 조각가들이 몇 톤이나 되는 재료를 가지고 해보겠다고는 하는데 안 되니깐 다른 조각가들 손을 빌려서 하는데, 그 모습에 나는 동…
홍: 선생님, 잠시만요. 요즘은 그런 발언 위험해요. 선생님도 지켜보셔서 아시겠지만, 세상이 근래에 많이 바뀌었어요.
문: 아, 맞다. 그렇지. 세상이 참 변했어. 미술계도 다 홀랑 뒤집혔던데. 그때 걸린 그 사람들 다 어디서 뭐 하고 있나 몰라. 어쨌든 그 조각 심포지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당시를 떠올려보면 나를 비롯한 모든 작가가 정말 후대에 자랑스럽게 남길 수 있는 걸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어. 야외의 땡볕 아래에서 작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인간의 힘을 초월하는 열정을 모두가 경험했어. 그런데 요즘 내가 떠돌다 보면 작업실에 있는 친구들은 그런 느낌이 아니야. 늙은이가 괜히 젊은이들한테 훈계하는 것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 우리 사이니깐 그냥 편하고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왜인지 모르게 젊은 친구들한테서는 그 뜨거움이 안 느껴진단 말이지. 그 밀레니엄인가 밀레니얼 세대가 부모에게 과잉 칭찬을 받고 자라서 자기가 특별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커서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절망하면서 기대를 감소시킨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런 건가.
홍: 그건 도대체 어디서 들으신 얘긴지 모르겠지만 저희 세대를 너무 싸잡아서 이상하게 일반화시키는 것 같아요. 밀레니얼 세대 중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문: 그건 말 그대로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나도 다 봤단다. 너희 부모님은 네가 별생각 없이 만든, 아직 철이 하나도 안 든 생각을 담은 미성숙한 작품까지도 일일이 열심히 봐주시고 우리 딸 다 컸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으시고, 너는 마음 한편에서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그래 난 잘 컸어.’ 하면서 자의식을 느끼는 것을. 그러면서 작업하다 뭐라도 하나 잘 안 풀리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혼자 쇼를 하더라.
홍: (…!) 도대체 저를 언제부터 지켜 봐오신 거죠?
문: 나는 어디에나 있고 아무 데도 없어.
홍: 그래도 저나 저희 세대에 대한 오해가 크신 것 같아요. 선생님 때와 지금은 예술의 사회적 위치나 예술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모더니즘 작가들을 공부하다 보면 그들은 뭔가 예술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고 예술을 위해 살고 죽으려 했던 것 같아요. 일단 선생님만 봐도, 제가 문신미술관 갔다가 선생님 묘비에 쓰여 있는 문구를 보고 정말 감탄을 했어요. 나는 노예처럼… 정확히 뭐였더라?
문: ‘나는 노예처럼 작업하고, 나는 서민과 함께 생활하고, 나는 신처럼 창조한다.’(2)라고 쓰여 있지.
홍: 그러니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대단한 에고를 가진 자였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요즘 시대에 어느 예술가가 자기 자신을 신이랑 동일시해… 최소 카니예 웨스트(3) 아니고서야. 그리고 ‘노예처럼’ 작업을 한다는 마인드도 참 신기했어요. 난 노예처럼 살기는 싫은데. 그럼 내가 미술가로서 자질이 부족한가 싶기도 하고.
문: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적 분위기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네 시선에선 내 묘비명이 이상하겠지만, 나의 동료 작가들은 나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신념을 가지고 살았을 거야
홍: 물론 자기 열정에 헌신하는 자세는 본받아야지만, 가난과 질병에 허덕이면서도 작업의 끈을 놓지 않은 몇몇 예술가들을 보면 솔직히 이해는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저는 권진규(4) 조각가를 정말 존경하지만, 그의 재능, 감각, 의지, 열정, 명예를 제가 다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생애는 절대 살고 싶지 않아요. 예술이 뭐라고 거기에 전부를 희생하나요? 예술은 그렇게 특별하거나 대단한 것도 아니고, 예술가도 그렇게 특별하거나 대단한 존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은 세상을 바꿀 수도 없을뿐더러, 예술 활동으로 돈을 버는 것조차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어떤 거대한 열망이나 선생님이 말씀하신 ‘뜨거움’을 안고 한다기보다는 가볍게 즐기는 마음으로 미술을 하는 거 아닐까요? 또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뜨거움은 너무 육체적인 부분에만 치우치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의 조각가들은 몸을 덜 쓴다뿐이지 충분히 예술에 대해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어찌 보면 요즘 친구들은 김종영(5) 선생의 ‘유희삼매(遊戱三昧)’(6) 정신과 맞닿아 있는 것 아닌가 싶어. 나나 국광이(7) 같은 경우는 조금 자신을 괴롭히면서 작업을 한 경향이 있지만, 김종영 선생은 크게 힘을 들이지는 않으면서도 성실하고 진중하게, 그리고 고요하게 작업을 하셨지. 마치 승려를 보는 것 같았다고 할까.
홍: 저도 김종영 선생님의 조각과 철학을 좋아하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젠틀하신 분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김종영 미술관에 갔다가 읽은 글에서 조금 놀랐던 부분이 있었는데, 김종영 선생님이 브랑쿠시를 완전 디스 하셨더라고요. 브랑쿠시가 지성이 부족한 게 유감이라고…
문: 그 정도 비판이야 할 수 있지. 조각계에선 브랑쿠시를 너무 신격화하는 경향이 있어. 그런데 김종영 선생이 그렇게 말한 건 그때 조금 힘든 시기라서 거칠게 말한 것도 없지 않아 있어. 당시에 돈을 못 벌어서 가족 전체가 힘든 시기였지.
홍: 아니, 김종영 선생님 같은 분도 돈을 못 벌었다고요? 이거 봐요. 이러니깐 미술을 믿고 나갈 힘이 생기겠어요. 요즘 작가들이라고 더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문: 원래 미술가라는 직업은 내 친구가 언제 한 말처럼 실망도 없고, 절망도 없는 거야. 인간은 뱃속에서 하나의 핏덩이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울부짖으면서 그날부터 전쟁과 같은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지. 나도 그런 마음으로 어렵게 생계를 꾸리면서도 작업을 했어. 그런데 나 때보다는 미술로 먹고사는 게 한결 나아졌다고 보는데. 내가 그냥 떠도는 게 아니라 요즘 전시도 많이 챙겨봐서 힘들어 죽겠는데, 하여튼 기금을 통한 전시가 정말 많더라고. 작가도 기금을 받고 전시하고, 독립 공간들도 기금을 통해서 운영하고. 그런 기회가 우리 시대에는 흔치 않았어.
홍: 그렇다고 그게 근본적으로 생계를 해결하지는 못하죠. 작가가 기금을 받아봤자 전시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따져본다면 크게 남는 건 없어요. 그리고 한 작가가 매번 전시할 때마다 기금을 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공간들은 기금이 없으면 오래 유지될 수 없을걸요. 그러다 보니 신생공간들은 사라지기 쉽고, 또 애초에 장기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물론 누군가 미술계에 봉사하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운영을 한다면 조금이나마 가능해질지는 몰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미술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가 많이 떨어진 시대에서는 힘들어 보여요.
문: 그런데도 그 소위 말하는 신생공간들은 계속해서 사라짐과 동시에 또 새로운 곳들이 생겨나던데? 이제는 이름 외우기도 힘들어.
홍: 그렇죠. 이건 저희가 했던 얘기랑 좀 다른 결의 이야기지만, ‘신생공간’으로 미술계에 널리 명명되고 인식되기 전부터 존재했던 공간들, 그러니깐 2015년 《굿-즈》 전부터 존재했던 공간들…
문: 나도 알고 있어. 다락방, 거래소, 미연이, 전자회로…
홍: 음… 뭐 이름이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 알고 계시네요. 어쨌든 그런 초기의 신생공간들은 제도권 미술계와는 관련이 없는, 제도권 밖에 있는 곳들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런 곳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고,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다뤄지고, 그 공간들에 몸담았던 작가들도 국공립미술관과 메이저 갤러리에서 전시를 하게 되니깐 신생공간이 제도권과 더 이상 관련이 없을 수가 없게 되었죠. 저처럼 초기 신생공간 시기에 몸담지 않은 세대에게는 더욱이나 신생공간이라는 것이 제도권으로 가는 징검다리의 역할 같아 보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요. 완벽한 미술계 안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바깥에 있는 것도 아닌. 전시 경력이 없고 기회가 많이 없는 학생/작가들에게는 첫 스테이지이자 자신의 작업을 주변에 알리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좋은 공간이기도 하고요. 또한, 앞서 말했던 소위 1세대(?) 신생공간들로 비추어 보았을 때, 이 ‘공간’이라는 게 뭐 직원 있고, 사업자 등록 하고, 비싼 간판 세우고 해야 하는 기존의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냥 SNS 계정 하나 파고 주소 올리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공간을 만든다는 것에 대한 심리적, 물리적 진입 장벽이 낮아져서 공간들이 생기기 더 쉬워지지 않았나 싶어요.
문: 내가 지켜보면서 느낀 바로는 현세대가 공통으로 느끼는 조급함도 작용하는 것 같은데, 그게 요즘 죄다 들고 다니는 그 손컴퓨터 때문일 거야. 손컴퓨터로 매일 쏟아지는 소식들을 접하니 자신을 남과 비교하기에 너무나도 수월한 시대이지. 누구는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누구는 벌써 저런 걸 했는데, 하면서 마음이 급급해지지 않을 수가 없을 거야. 실제로 데뷔 연령도 우리 때보다는 많이 낮아졌지. 수명은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말이야. 하여튼 젊은이들이 빨리 무언가를 선보이고자 하는 조급함을 가지는 것도 신생공간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 이유에 일조한다고 생각해.
홍: 그런데 조급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잖아요. 좋은 자극이 되어서 스스로 채찍질을 하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조급한 마음도 있겠지만, 미술계 모두가 공공기금으로 지원을 받고 전시를 하는 것을 지향하는 시스템 안에서 경쟁에 지쳤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기금을 탈 수 있는 작가나 기획자는 한정되어 있고, 경력이 많거나 적거나 모두 같은 경쟁에 뛰어들어야 하는데, 거기서 계속해서 ‘탈락’하는 사람들은 앉아서 가만히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자기가 자기 전시를 할 공간이라도 만들어야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요즘의 신생공간들은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하네요.
문: 어떤 면이?
홍: 가장 처음의 신생공간들은 뭔가 펑크스러운 면이 있었다랄까… 그냥 거침없이 생겨나고, 거침없이 전시하고, 거침없이 사라지고. 각자의 색깔이 분명했고 공간의 위치, 형태, 전시의 결 등 여러모로 실험적이라고 느껴졌어요. 트위터로 띡 하고 한 줄로 전시 소식 알리고. 그런데 요즘 생겨나는 공간, 이것도 신생공간이라고 칭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생기는 공간들은 기성 갤러리나 지금의 대안공간과 다른 점이 별로 안 느껴져요. 뭔가 오피셜하게 웹사이트도 만들고, 문체도 딱딱하고, 그곳의 운영자나 전시하는 작가들도 어느 정도 이미 잘 알려진 사람들이고. 오래가지 못하고 사라진다는 속성만 빼고는 1세대 신생공간과는 결이 많이 다르지 않나 싶어요.
문: 나는 공간들이 하도 뭐가 많아서 잘 모르겠지만, 공간에서 전시되는 조각에는 주목했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즘의 공간에 조각도 영향을 받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너도 알다시피, 조각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바로 문의 크기잖아.
홍: 그쵸. 요즘 공간의 크기가 작아서 조각도 작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 물론 그런 면도 있지. 전시 공간은 둘째 치고 작업실들이 다 크질 않은 데 만드는 조각이 클 수가 없지.
홍: 서울 땅값이 이 모양인데 어쩔 수 없는 거죠. 교외의 넓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에서 작업하는 작가들도 있지만, 그러려면 또 차가 있어야 하고… 진짜 노답이에요.
문: 그러게, 참 요즘 작업들 하는 공간을 보면 가슴이 아파.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전시를 하고 나서 그 금쪽같은 조각들을 다 버리는 풍경이야. 작업실로 도로 가져가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고. 그런 면에서 생겼다가 반짝하고 사라지는 신생공간들과도 속성이 비슷하다고 느껴졌어.
홍: 뭐, 신생공간도 현실적인 조건들 때문에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장기적인 운영을 목표로 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조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입체 작품들을 보관해서 짊어지고 가려면 공간도 필요하고, 공간을 옮길 때 운송 비용도 들잖아요. 보관에 드는 부담이 작업을 오래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가능성보다 크기 때문에 전시가 끝나면 그냥 버리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작품 보관 자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것일 수도 있죠. 또한, 선생님 말씀대로 요즘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이미지들이 넘쳐나는데, 그 이미지의 무더기 속에서도 새롭고 신선한 것을 제시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잖아요. 경력이 많지 않은 작가들에게는 느린 호흡으로 긴 주의 집중을 요하는 작업보다는 에너지가 반짝해 보여야 시선을 끌 수 있고, 또 그때의 호응을 바탕으로 새로운 전시를 이어 나갈 수 있는데, 이미 만든 것, 이미 지나간 것보다는 앞으로 새롭게 만들 것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작품 보관에 신경을 안 쓰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팔릴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보관하고 싶지, 안 그래도 콩알 만한 미술시장에 요즘같이 내구성 없는 재료를 쓰는 조각을 누가 사요?
문: 손컴퓨터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과 성공에 익숙해서 어떤 성취를 이루는 데 시간을 투자하는 의미를 찾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닐까.
홍: 그놈의 손컴퓨터… 왜 어른들은 모든 것을 컴퓨터 탓할까요?
문: 하긴, 그래도 신자유주의의 논리에 비추면 조각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다는 것에는 동감한다.
홍: 효율적이진 않겠지만, 조각은 효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오히려 너무나도 비효율적이라서 아름다운 것이 아닐지. 그래서 선생님의 조각을 보면 항상 경이롭고 마음이 겸손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문: 훗. 그나저나, 벌써 해가 밝고 있어. 나는 어서 하늘로 돌아가 봐야겠다. 작업 마무리 좀 해야 해서.
홍: 거기서도 작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정말 열정이 대단하시네요.
문: 하늘이라고 여기랑 뭐 다를 줄 알아? 거긴 말도 안 되게 더 치열해. 브랑쿠시 선생은 이미 위에서 개인전을 312번이나 치렀어. 그 양반은 진짜 병인 것이 틀림없어.
홍: 어쨌든 아쉽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내의 젊은 학생이나 작가 지망생에게 한마디만 남기시면 어떨까요?
문: 쉽게, 단시일에 성공하려는 생각 말라는 말로 전부이겠어. 서울에 와서 듣자니, 어느 작가가 큰 집을 지었다느니, 또는 굉장한 생활을 하고 있다느니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런 생활의 여유를 갖고 작품 재료를 풍족하게 쓰며 창작에 몰두하면 더 좋은 작품이 나올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나도 내 아틀리에엔 꼭 필요한 가구 나부랭이밖엔 아무것도 없어.(8)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선생님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지셨다. 너무나도 급작스럽고 짧은 만남이었지만, 내가 그토록 동경하던 문신 선생님과의 대화는 생각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작업을 혼자 하다 보면 ‘이건 하늘에 계신 OOO 선생님이 절대 용납하실 수 없을 거야…’ 하며 종종 자신을 채찍질하거나 반성했지만, 그들도 이 시대를 살았다면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의 생각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돈다. 무겁고, 느릿하고, 힘들고, 큰 조각은 더 이상 새롭게 탄생할 수 없는 것일까?
류인(柳仁, 1956~1999). 한국의 조각가. 변형, 왜곡된 인체 조각을 통해 문명 비판적인 시각과 인간의 고독하고 소외된 모습을 표현하고자 했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추산동의 문신미술관 야외 언덕에 위치한 문신의 묘에서 해당 묘비명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조각가 콘스탄틴 브랑쿠시(Constantin Brâncuși, 1876~1957)가 생전에 남긴 글귀인 ‘신처럼 창조하고, 왕처럼 명령하고, 노예처럼 일하라.’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브랑쿠시는 루마니아 태생 프랑스의 조각가로, 모더니즘의 창시자 중 하나이자 20세기의 가장 영향력 있는 조각가로 꼽힌다.
카니예 웨스트(Kanye West, 1977~). 미국의 래퍼, 프로듀서, 패션 디자이너
권진규(權鎭圭, 1922~1973). 한국의 조각가. 근대 조각을 대표하는 조각가 중 하나로 고졸 양식의 조각에 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국적 리얼리즘을 찾고자 하였다. 생활고와 고독감에 시달렸던 그는 “인생은 공空 파멸”이라고 쓰인 유서를 남기고 작업실에서 목을 매 숨졌다.
김종영(金鍾瑛, 1915~1982). 한국의 조각가. 한국의 순수초상을 개척한 조각가로 동양적 자연관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조형세계를 구축하였다.
유희삼매(遊戱三昧). 즐겁게 놀고 장난하는 데 열중함. ① 부처의 경지에서 노닐며 그 무엇에도 사로잡히지 않음. ② 중생을 구제하는 데 전심함. ③ 예술 같은 것이 戟塵(극진)한 경지에 이름을 말함. 출처=조기형, 『한자성어 고전명언구 대사전 23000어』(서울: 이담북스, 2011), p.525.
전국광(全國光, 1946~1990). 한국의 조각가. 조각의 기본 요소인 ‘매스(mass)’를 자신이 싸워야 할 ‘적’으로 여긴 조각가로 매스의 내면을 탐구하는 데 주력했다.
마지막 문답은 문신의 실제 인터뷰에서 발췌하였다. 이구열, 「자연스러운 불균형의 조화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각’- 문신씨가 말하는 예술과 파리에서의 작업」, 『공간』, 1976. 10.
Jun. 2019/ 박하사탕으로 알아보고 나서――하얀 마름모꼴 이후 Through Peppermint Candy――After the White Diamond / 콘노 유키 Yuki Konno
김문기 홍기하 2인전 <박하사탕>, (별관, 2019)
https://outhouse.kr/entry/%EB%B0%95%ED%95%98%EC%82%AC%ED%83%95
박하사탕을 인식하려면 시각적인 경험에만 의존할 수 없다. 말하자면 체험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의 시각적인 인식과 연결된다. 겉보기에 보석처럼 보이는 박하사탕은 아예 처음 봤을 때, 먹을 수 있고 입에 넣으면 없어지는 사탕이라는 생각을 누가할 수 있을까? 지금이야 직접적 혹은 간접적 경험――먹었거나 “이게 사탕이래!”라고 들었거나――을 통해 그것을 박하사탕으로 인식할지 몰라도, 겉보기에는 마치 보석 같이 생겼다. 박하사탕을 ‘박하사탕으로’ 인식하려면 그 ‘보석 닮은 것’을 입 안에 넣어야 한다. 먹다가 깨지고 점점 없어지는 사탕은 애초의 모습으로 온전히 있질 못한다. 변형과 소멸로 다가가는 과정에서 시각적으로 비친 보석은 점점 원래 모습을 잃어간다. 이미 입 안에는 보석처럼 고귀하거나 세련된 물건이 아닌, ‘박하사탕’이 들어가 있다.
이번 전시제목인 ‘박하사탕’은 필자의 생각에 적어도 순수함과 거리가 멀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작업하는 동기가――영화 <박하사탕>의 제목을 가지고 온 것과 같이――순수할지언정 결과물을 보면 순수하지 않은 작품, 바꿔 말하면 ‘순수 조각’이 아닌 것들이다. 전시장에 들어가면 찌그러든 작품과 일상에서 가벼워 보이는 물건을 단단하게 만든 두 종류의 작업을 볼 수 있다. 이것들은 적어도 봤을 때 기존 조각(=순수 조각)과 모양새도 작품에서 오는 느낌도 다르다. 기획자 서문에도 나와 있듯, 이번 기획은 조각의 기존범주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서도, 문장 중간에서 ‘오브제’라는 말로 (아마도 의도치 않게) 일부분 대체되듯, 조각이라는 하나의 범주가 오늘날 정의하기 어렵고 모호해진 상황을 보여준다. 필자가 당장 여기서 조각의 범주를 <박하사탕>에서 선보이던 두 작가의 작업을 가지고 새로운 정의를 내리지 못하지만, 이번 전시를 통해서 조각작품의 시간성――박하사탕의 인식 과정처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시간성이라는 말은 조각에서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설치의 규모까지 전개되었을 때 신체적으로 동반되는――그 유명한 리처드 세라(Richard Serra)의 <기울어진 호>(1981)처럼――시간성이 있고, 다른 한편 대지미술로 불리는 몇개의 작업에서 물성과 환경의 관계가 그렇듯이 작품자체의 모양이 시간을 거쳐 변화하는 경우도 있다. <박하사탕>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두 작품의 각 특징들, 그리고 전시방법에서 시간성을 확인할 수 있다. 때리고 힘을 받은 것――원인과 결과로 나온 사태, 그리고 올려진 것과 안 올려진 것――전시가 된 혹은 전시 준비중인 상태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간성이란 어떤 단채널 영상 이미지가 재생되는 것과 다르다. 오히려 작가 둘의 작업 사이의 관계나 전시공간의 배치방법을 통해 감지되는 단계에 의한 시간성이다. 힘을 받았거나 혹은 작품이 올려져 있거나 좌대쪽에 숨어 있는 것과 같이, 양극단의 상태를 통해서 과정을 암시한다.
한편 작품자체에 동반되는 시간성이 존재한다. 이를 기념비적인 것들――미래를 내다보는 혹은 미래가 이미 도착한 것――이라 하자. 필자가 앞으로 살펴볼 시간성은 기념비적 시간성이다. 이번 전시에서 홍기하의 작업은 미래를 내다보는 조각이라 할 수 있고, 반면 김문기의 작업은 미래가 이미 도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먼저 홍기하의 작업에서 조형물은 주로 일상에서 보는 소재들을 단단한 돌로 만든 작업이다. 예컨대 ‘약 125년이 지나면 이 댓글 섹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어있을 것이고 이 지구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로 채워져있을 것이다. 그냥 변기에 앉아서 생각해볼 거리. 미래의 당신들에게 명복을 빕니다.’라는 인스타그램 유머 포스팅의 문장과 아스키 아트(ASCII Art)처럼 생각하는 인물의 모습을 문자로 이미지화한 온라인 상에서 볼 수 있는 비물질적인 대상이나, 석고보드 텍스나 배너 거치대로 쓰이는 물통처럼 일상에서 마주보는 좌대와 같은 바탕들이다. 여기서 작가가 다루는 소재는 지금 시점에서는 일상에서 흔히 쓰이고 원래 조각이 아닌 것들이다. 작가는 그 대상을 외주 제작을 통해 무거운 재료로 보여준다. 여기서 시간성은 미래에 남을 수 있게 현재의 순간을 박제하여 단단한 물질로 정착시킨다. “플라스틱이 돌보다 오래 더 가는데?”라는 반론은 적절하지 않고, 오히려 작가는 궁극적으로 스쳐 지나가버리는 장면에 미래를 담보하는 데에 무게중심을 부여한다. 그의 작업에서 기념비성은 이미 사라졌거나 지나간 기억의 지표로 기능하기보다, 곧 사라질지도 모르는 대상을 조형물로 기록하여 미래로 향하는 시간을 약속한다. 반면 김문기의 작업은 연약하게 비춰져 기념비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그런데 기념비가 일종의 시간적 지속을 위해 미래로 나아가는 일에 봉사한다면 찌그러진 형태는 이미 형태 자체가 어떤 힘을 받았다는 결과로서 드러난다. 그의 작업은 어떤 힘을 받아 이미 구겨진 상태로 있으며 결과물로서 과거를 간직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김문기의 작업 또한 기념비적이다. 앞서 홍기하의 작업이 (미래로) 남기기를 위한 것이라면 후자는 남겨진 것들에 더 가깝다.
이와 같은 작품의 두 성격은 전시에 포함된 두 텍스트(작가 노트식의 편지)에서 마찬가지로 드러난다. 홍기하는 편지의 형식으로, 반면 김문기는 SNS 채팅 내용이나 문자 메시지처럼 그때 그때마다 상황과 내용이 짧게 나타난다. 짤막한 텍스트와 편지의 시간성, 전자는 오래 기억될 일 없이 흩어지는 문자 메시지처럼, 후자는 먼 미래에 누가 읽을지도 모르는 형식으로 보관된다. 두 편지의 성격은 작가의 작업 성격과 일치된다. 과거를 보존하느냐 미래를 향해 기록하느냐에 따른 두 작업은 각기 다른 기념비의 시간성을 작품에 내포한다. 회고적 역사보존이 예견적인 것으로 전환되면서 새로운 건축물과 보존건축의 시간차를 ‘0년’이라는 말로 설명한 렘 쿨하스(Rem Koolhaas)의 말[1]을 거쳐, 전시장 안에서 두 작가의 작업은 과거의 보존과 미래를 향한 보존하는 태도가 거의 ‘영점’에 도달한 기념비라 말할 수 있다. 로버트 스미드슨(Robert Smithson)이 댄 플레빈(Dan Flavin)의 <타틀린을 위한 7번째 기념비>을 (전형적인) 시간축에서 떨어져 나온 ‘즉각적인 기념비(instant monuments)’라 부르는 것과 달리[2], 두 작가의 작업은 과거의 지속과 미래를 예견한 지속(적 상태)의 화살표를 사이에 두고 거의 영점에 도달한――아킬레스와 거북이 이야기처럼――현재에 나타난다. 각각(의) 시간을 지속시키기 위해 과거의 현재화와 미래를 향한 보존 태도가 조형물에 반영된다. 작품을 보면서 관객들은 원래 모습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보석 닮은 하얀 마름모꼴’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박하사탕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다. 박하사탕을 깨질 수도 녹아내릴 수도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두 작가의 작업에서 조형물 자체에 이미 도래할 미래와 이미 벌어진 상태로서 과거를 간직하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다. 조각 작업 뿐만 아니라 ‘조각’에 대한 관람자의 인식에 이미 순수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적어도 현재란 그런 시간이다――과거가 오고 곧 미래로 가는 화살표(→→) 사이에서 시간의 힘을 받고 또 뻗어가는 영점에 두 작가의 작업은 위치된다.
콘노 유키 (미술비평)
[1] Rem Koolhaas, CRONOCAOS, Log No. 21 (Winter 2011), pp. 119-123 참조
[2] Robert Smithson, Entropy and the New Monuments, Artforum (June 1966) 참조
Moongi Gim, Khia Hong Duo Exhibition <Peppermint Candy>, (Outhouse, 2019)
Recognizing a piece of peppermint candy cannot solely depend on visual perception. In other words, one has to experience the object in order to fully recognize it. Who would think of a piece of peppermint candy as candy that one can taste and melt in one’s mouth, when in fact it looks like a piece of gem at a first sight? Unless one has tasted or is notified that the object is a peppermint candy, she won’t know because its appearance is similar to that of a piece of gem. To recognize the peppermint candy as a candy, one has to put it in her mouth. As the candy moves and melts in one’s mouth, it does not stay in its original form. Through the process of deformation and dissipation, what looked like a jewel slowly loses its structure. In one’s mouth is not a precious or polished jewel, but a mere piece of a peppermint candy.
At least from what I think, the exhibition, “Peppermint Candy”, is far from purity. The title of the exhibition is taken from the film Peppermint Candy directed by Changdong Lee in 2000, which might suggest the theme of purity or innocence; however, what the artists produced are not pure works, or in other words, “pure sculptures”. Entering the exhibition two types of works are on display: 1) sculptures that are crumpled up and 2) daily objects turned into solid and heavy sculptures. The two are different in form and demonstrate distinct features from conventional sculptures(=pure sculptures). As mentioned in the preface of the exhibition, the curation proposes a question on the conventional category of sculpture since defining what “sculpture” is difficult and ambiguous; therefore, the term is substituted (perhaps unintentionally and unconsciously) with the word “object”. Although finding a new definition of the sculpture through the two artists’ works can be time-consuming, through this exhibition, I want to talk about the temporality of sculpture as in the process of recognizing a piece of peppermint candy.
How does the term “temporality” relate to sculpture? In the well-known work Tilted Arc by Richard Serra in 1981, physical temporality is accompanied in the scale of the installation, and there is the temporality in Land Art where the physical shape of the sculpture changes over tim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erial and its environment. In the display of “Peppermint Candy”, the characteristics of both works can be discovered through temporality. Two arguments can be made about the works: 1) Crumpled paper sculptures and rock-hard stone sculptures seem like the former is the result of what was caused by the latter and 2) the works that are placed on pedestals and ones that are on the floor seem like some works are on display while some are not yet ready to be installed; therefore, in this case, the “temporality” is different from that of a single-channel video on play. Rather, the temporality is perceived b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k of the two artists and the juxtaposition of the sculptures within the exhibition space. The process is implied through the two extreme and contrasting states.
Temporality also exists in the works themselves. Let’s say that they are monumental works where the future is either forecasted or has already arrived. The temporality that I will explore here is the monumental temporality. Khia Hong’s works forecast the future, while the future has already arrived in the works of Moongi Gim. To begin, Hong’s works are stone sculptures of subjects we can easily encounter in our lives. For example, two of her works are on immaterial subjects found online such as an Instagram post that reads “In about 125 years everyone in this comment section and in the world will be dead and the earth will be repopulated by people who haven’t even been born yet. Just some things I think about while I sit on my toilet. RIP ya’ll from the future,” and ASCII Art where a figure of a man with a thought bubble is pieced together with ASCII characters. Also, ordinary objects like plasterboard ceiling tile or outdoor banner stands are displayed as sculptures. The subjects that the artist touches upon are commonly seen in everyday life and are not considered usual sculptures. Hong presents these objects in heavy stones through outsourced production. The temporality here perpetuates the present by fixing the works into solid materials in order to remain in the future. The counter argument “Doesn’t plastic last longer than stone?” is not appropriate, and rather, the artist guarantees a future for moments that will ultimately pass by. In Hong’s works, monumentality does not function as an indicator of past or forgotten memories; instead it promises a time in the future by documenting the objects that will eventually disappear. On the other hand, the sculptures of Moongi Gim may appear to be far from monumentality as they are made out of flimsy and fragile materials. However, monuments serve to remain in the future, and the crumpled form of his pieces in itself is a form of result- the sculptures have already been crumpled with some force and retain the past as a result. In that sense, Kim’s works can also be monumental. Hong’s works serve to remain in the future, while Kim’s works are close to what’s left of the past.
Two opposing characteristics are also demonstrated in the two texts written by the artists. While Hong writes in the form of a letter, Kim writes a series of short, sporadic messages that resemble online or mobile text messages. The temporality of short texts is documented as a text message that does not have to be remembered, and the temporality of a long letter is kept in a format that someone in the distant future can possibly read. The nature of the two texts coincides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artists. The two works of either preserving the past or documenting the present for the future connote the temporality of each monument in their respective ways. As retrospective preservation is becoming prospective and with the words of Rem Koolhaas who explained that “the time lag between a new construction and a preserved architecture has collapsed from two thousand years to almost nothing”[1], the work of the two artists in the exhibition can be seen as monuments where preserving the past or preserving to remain in the future have almost reached close to a “zero point”. Contrary to Robert Smithson’s comment on Dan Flavin’s Monument 7 for V. Tatlin as “instant monuments” that are “against the wheels of the time-clock”[2], the two artists’ works are placed in the present, as in the story of the Tortoise and the Achilles, where a continuation of the past and the future are reaching towards a zero point. In order to maintain temporality, the making-present of the past and remaining for the future are reflected in the sculptures.
Upon seeing the works the audience does not recall a “white, gem-like diamond shape” that stays in its original form. We already know what a peppermint candy is. Not only in the sculptures themselves but also in the perception of the audience of a “sculpture”, purity does not exist. At least that is what the present is. The works of the two artists are placed at the zero point of a timeline between an arrow from the past and another that is heading towards the future.
Yuki Konno (Art Critic)
[1] Rem Koolhaas, CRONOCAOS, Log No. 21 (Winter 2011), pp. 119-123
[2] Robert Smithson, Entropy and the New Monuments, Artforum (June 1966)
Feb. 2019/ 오스티아 안티카의 미네르바 여신상을 제작한 조각가에게 To the Sculptor of the Statue of Minerva in Ostia Antica / 홍기하 Khia Hong
2년 전에 당신의 조각상을 마주했던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지금은 미네르바 여신의 얼굴이 반이 사라지고 팔은 양쪽 다 실종되어 초라해 보일 수 있지만, 저는 그 앞에 한참을 서서 당신에 대한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스티아 안티카의 입구에 우뚝 서 도시의 위상을 자랑할 조각을 제작하라는 의뢰를 받았을 까마득한 과거를 상상해보게 됩니다. 그 거대한 돌을 쪼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동료 조각가들보다 더 중요한 작품을 맡게 되어 으스댔을 수도 있고, 조각상이 세워지는 날 시민들이 감탄할 생각으로 힘든 노동을 이겨냈을 수도 있고, 어쩌면 먼 과거 조상들이 남기고 간 헬레니즘 조각을 카피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한계에 실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찌 됐든 그 조각상은 도시 입구에 설치되어 몇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조각상 앞에 서니 묘한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조각상을 만들고, 세우고, 바라봤을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사라졌지만, 변함없이 존재하고 있는 그 조각상으로 인해 제가 상상하기조차 힘든 먼 과거가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을 통해서만 우리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이슬란드에 여행을 다녀왔다 하더라도, 아이슬란드에서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지 않는다면 과연 다녀왔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분명히 언젠가는 존재했을 당신도 당신의 조각상이 없었다면 지금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당신이 정확히 누구인지 인적사항이 알려진 바는 없지만, ‘오스티아 안티카의 미네르바 여신상을 제작한 조각가’가 존재했다고는 말할 수 있고, 이렇게 지금처럼 제삼자에 의해서 당신이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당신과 동시대를 살았던 수많은 친구, 가족, 동료들은 이와 달리 더는 아무의 입에도 오르지 않고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않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제게 당신의 조각상이 강렬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도 어떻게 보면 당신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엄밀히 말해 조각가는 아니지만, 시각적인 무언가를 만들어 남들에게 보여주는 일을 한다는 점에서 당신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조각상 앞에 섰을 때 제가 과연 이것보다 더 멋진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건 미술을 넘어서서 삶에 대한 거대하고 근본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생애를 이렇게 아등바등 힘들게 사는 이유는 결국 ‘내가 이 땅에 살았다는 흔적을 남기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만들었던 작품들을 되돌아보면, 결국 몇십 년을 견디지 못하고 사라질 불안정한 디지털 파일과 찌그러지고 마모될 플라스틱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시간을 쏟고 돈을 들여 만들어도 제가 죽은 후에 사라질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처럼 제 몸도 썩어 문드러지고 저를 기억하는 사람들도 모두 죽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보다 강력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몇만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세월의 풍파를 거칠수록 더 멋스러워지는 유일한 물질입니다. 어찌 보면 돌이 없으면 인간도 없겠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결국 당신이 살았던 도시에 현재 남아있는 것은 모두 돌입니다. 아무리 당시에 날고 기고 했던 사람일지라도 먼 미래에 그들의 존재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것은 그곳에 남아있는 유물뿐입니다. 저도 당신의 작품처럼 아주 먼 미래의 후손들이 아주 먼 과거가 존재했음을 확인하고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도 생각해볼 수 있는 조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라는 사람이 길이 기억되길 바라는 것이겠죠.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난 지 약 이천년이 지난 시대에 지구 반대편에 사는 누군가가 당신의 조각을 좋아하고 당신을 떠올렸으며, 이를 통해 또 다른 창작을 이어나갔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이 글을 바칩니다.
당신과 만나게 될 언젠가를 기리며,
홍기하 드림
P. S. 슬프시겠지만 오스티아 안티카는 서기 800년대에 폐쇄되어 방치되다 1900년대 초반에 발굴을 시작해서 현재 유적공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유적지인 것은 아닙니다. 관광객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인 로마는 왔고, 온 김에 폼페이도 보고 가야 할 것 같지만, 사전에 검색해보니 생각보다 멀고 사람이 미어터진다는 후기가 많아 망설이던 와중에, 보다 가깝고 한적한 곳에 ‘폼페이스러운’ 유적지가 있다는 여러 글에 따라 차선으로 방문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To the Sculptor of the Statue of Minerva in Ostia Antica,
I remember the moment two years ago when I first encountered your sculpture. Although Minerva looked shabby with half of her face shattered and both of her arms missing, I could not help but stand there and stare at her. And I started to think about you.
I tried to imagine the past when you would have received the commission to make a monumental statue that would pridefully stand tall at the entrance of Ostia Antica. What would have crossed your mind as you pecked the enormous stone? You could have been full of yourself with the fact that you were doing something more important than your fellow sculptor friends, or rather, disappointed in yourself that you could not do more than just copy a Hellenistic sculpture from your distant ancestors. Whatever the case may have been, your statue was successfully installed at the city entrance and is still standing in place after thousands of years.
Standing in front of such statue surely felt strange. All those who made, installed, and appreciated it have now vanished. However, I could confirm through your statue that a past unfathomably far away did exist indeed. We can ensure our existence through relationships with others. If I visited Iceland but did not post a picture on my social media, can I say that I actually went there? Likewise, you who definitely did exist at some point in the past, would not have existed if it were not for your sculpture. Well, we still don’t know the specifics such as your name, sex, or origin, but we can say that there existed “a sculptor who made the Statue of Minerva in Ostia Antica”. And more importantly, you are still being talked about, while most of your friends, family, and colleagues are probably forgotten in the words and memories.
I think your sculpture was a great impact for me since we do similar things. Strictly saying, I may not be a sculptor, but we both make visual objects for others to see. Nonetheless, as I stood facing your sculpture, I doubted if I have the talent to make something greater than yours. It is probably because your work was speaking not just on the level of art but of something greater and fundamental about life. It crossed my mind that the reason why we struggle our ways so much in this short, mortal life is to leave a trace in this world saying, “I was here.” Looking back at my past projects in that note, I came to realize that they are mere unstable digital files and plastic that will eventually shrink or wear away in a matter of a few decades. What is the meaning behind pouring all my precious time, energy and money in them if they will be all gone once I’m dead? What does it matter if my body will eventually decompose like yours did and all who remember me die?
This is why I think there is nothing greater and more beautiful than stone. Stone stays itself for thousands of years, and it is the only matter that becomes more stylish over time. I even came to think that humans would not even have existed without it. After all, all that is left in the city you lived in are pieces of stone. No matter how famous or legendary a person may have been at the time, only the artifacts that are left behind can confirm her existence in the distant future. I want to make sculptures that will assure my future generation the existence of a far-away past and make them think back at the fact of their own existence, as yours did for me. But more importantly, of course, what I want the most is making a name for myself to be remembered.
This letter goes out to you; I want to let you know that someone on the other side of the world living two thousand years after you died admires your work and thinks deeply of you and has motivated me to pursue art.
Looking forward to the day we will meet,
Khia Hong
P.S. Sad news: Ostia Antica was abandoned in the 9th century. But it was excavated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is now an archaeological park. Although not particularly a famous one, it became a place where tourists in Rome who feel like they need to also visit Pompei while they’re at it but are hesitant after reading reviews saying that it’s packed with tourists visit as a secondary choice hearing that there is a “Pompei-like” site nearby that’s less crowded.